중국의 평화협정 제안, 북의 핵보유국 자격 인정하잔 건가
중국의 평화협정 제안, 북의 핵보유국 자격 인정하잔 건가
Posted February. 19, 2016 07:33,
Updated February. 19, 2016 07:4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제안했다. 왕 부장은 “갈등이 큰 문제는 모두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수단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탓에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의 취지는 각국의 주요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평화협정은 지난달 6일 4차 핵 실험한지 나흘 뒤 노동신문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긴장 격화의 발생 근원인 미국 적대시 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 사항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문제는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북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핵보유국의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적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에서다.
중국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옮기는 것은 중국의 ‘안보이익’과 전략적 목표가 북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에 평화협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왕 부장 말처럼 비핵화와 ‘동시 추진’이 아니라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더구나 북핵 해법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벌일 경우 결국 북의 핵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북-미 수교 등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로 김정은에 월계관을 씌어주는 것이 현 국면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정전체제는 6·25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유엔군이 파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은 당시 미국이 맡고 있던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됐다. 휴전에 반대했던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화협정으로 정전체제가 소멸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도 약해진다.
평화조약이 반드시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은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월남을 무력침공하면서 1975년 4월 공산화됐다. 북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이런 것이다. 중국은 비현실적인 제언으로 북 도발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북이 두 손 들고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한 압박부터 하는 것이 옳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10번 북송된 그녀, 73만 유튜버 되다…탈북 유튜브 ‘유미카’ 뒷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c/138/175/90/1/wps/NEWS/IMAGE/2025/12/12/13293895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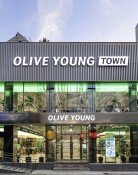
![우크라 전쟁이 불씨 지핀 ‘유럽 징병제’ 논의… 청년층 거센 반발[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c/138/175/90/1/wps/NEWS/IMAGE/2025/12/13/132956270.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