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우물 안 서울대
20세기가 전문화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다. 베스트셀러 생각의 탄생을 쓴 미시건 주립대 로버트, 미셀 루트번스타인 부부는 전문화가 가속하면서 지식이 파편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 지식이 확장되고 있지만 학문간 교류는 줄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개개인의 종합적 이해력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자성() 속에서 하버드대를 비롯한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물어 학문 융합과 통섭의 길로 나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초빙석좌교수로 재직했던 미국 뉴욕주립대 역사학과 김성복(78) 석좌교수가 서울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대 교수들은 학문보다는 술이나 정치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개탄했다. 김 교수는 또 교수들이 줄 세우기나 자리보전 같은 눈앞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봉건적 할거주의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교수사회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 사이에도 소통 장애가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예컨대 서울대 법대 건물에서 교수 연구실이 있는 층은 카드 열쇠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수와 사전 약속이 있어야만 교수 연구실에 출입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학부 중심 대학(리버럴 아츠 컬리지) 교수들의 연구실은 항상 개방돼 있다. 학생들이 면담시간을 내지 못할 경우 교수들은 과제물에 대한 코멘트를 녹음해 오디오파일로 보내준다. 김 교수는 교수 평가항목 가운데 연구보다 교육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제안한다.
서울대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데도 세계 대학랭킹에서 순위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전공이기주의와 폴리페서(선거 때마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가 문제다. 1956년 갈라진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정치외교학부로 통합돼 올해 최초의 신입생을 뽑는데 55년의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서울대는 전공의 벽이 높다. 선거철에는 정치색에 따라 교수들의 편 가르기가 시작된다. 김 교수의 지적 사항은 비단 서울대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지난해 연말 확정된 서울대 법인화를 계기로 서울대가 한 걸음 도약하려면 김 교수의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 성 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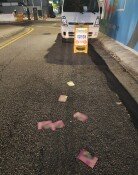
![반찬통 착색 고민 끝…‘두부용기’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알쓸톡]](https://dimg.donga.com/c/138/175/90/1/wps/NEWS/IMAGE/2026/01/09/133126593.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