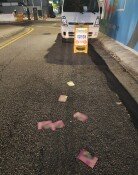[오피니언] '햇볕' 밖에서도 샜다
지난주 일본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대북 정책의 한미일 3국공조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고이즈미 총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한 한반도 전문가(일본 방위청 제3연구실장 다케사다 히데시 교관)는 역설적으로 풀이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문제를 다루면서 좀 더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일본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놓고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외무성 관리들은 말을 아꼈지만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전문가들은 대부분 햇볕정책에 회의적이다. 안의 퍼주기란 비판 못지 않게 밖에서도 너무 헤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그런 사실을 애써 외면해온 것이 분명하다.
햇볕정책이 궁지에 몰린 원인은 국제정치 기류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를 제대로 읽지 못한 외교안보정책의 무기력에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남들은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유연성을 높였다. 10년전만 해도 꺼내기 어려웠던 일미 동맹이란 말이 지금 일본사회에서는 별 저항없이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끈질긴 공론화 노력의 소산이다. 엄밀히 말해서 현재 햇볕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자세는 미국쪽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우리는 50년 혈맹에만 집착했고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너무 몰랐다. 미국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전략변화를 간파했어야 했다. 남북문제 해결에 어차피 미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현실 아닌가. 1871년 독일통일을 앞두고 국제협력이 절실했던 비스마르크 총리는 국내에선 보수철권을 휘두르면서도 밖으로는 대담하게 프랑스의 주류 개혁파를 지지했다. 외교는 그런 것 아닌가.
또 현정권은 햇볕정책을 한반도로 너무 국지화(localize)시켰다. 대북정책을 지역화(regionalize)하고, 세계화(globalize)하는 정책의 외연() 노력이 있었다면 국제적으로 더욱 설득과 지지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몸을 던져 전쟁을 억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전략차원의 논리로 구성한다면 분명 만만치 않은 외교정책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의 중장기 전망을 포함해 안팎의 담장을 새로 뜯어 고쳐야 한다. 지금 같아서는 한발짝도 더 내딛기가 어렵다. 누구보다 김 대통령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규철(논설실장)
ki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