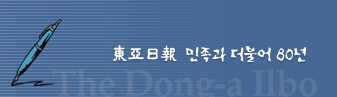|
2. 동아일보 기사 문장의 변천
1920년 4월1일 창간된 동아일보의 기사는 국한문 혼용으로
시작해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점차 한글전용이라는 큰 물결을 따라 발전하고 있다. 표현 방법은 전문(傳聞)하는
형태인 ‘∼더라’에서 ‘∼하였다 한다’로, 다시 ‘∼하였다’로 바뀌었다. 통신수단 및 취재기법의 발달과
더불어 문투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1933년에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7개월이나 앞서 채용해 기사 작성에 활용했으며,
1967년에는 상용한자 2000자를 제정해 그 외의 한자는 철저히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일반 국민의
어문생활에 기여했다. 1997년부터는 한자를 사용할 때 제목과 인명,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낱말에만 제한적으로 괄호 속에 병기하는 방식을 써 한글전용에 한발 더 다가섰다. 1998년부터는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했다.
창간 직후(1920년대)
이 시기의 기사 문장에서는 정치·국제·지방기사 등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했으며 사회면 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단어는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여 누구나 읽기 쉽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띈다. 1920년대의
국한문 혼용 문장에서 한글은 일반적으로 토를 다는 수준으로밖에 쓰이지 못했다.
그러나 한글 위주로 쓴 사회면 기사에서는 ‘지난달삼십일오전령시경’ ‘지난이십구일오전열한시반경에’에서와 같이
숫자까지도 한글로 표기했다. 띄어쓰기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두점도 극히 일부에서만 모점(′)이 쓰일 뿐이었다.
지명·인명의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했으며 나이를 나타낼 때에는 별도의 괄호 속에 한자로 표기했다.
당시의 문장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라더라’ ‘∼다더라’ ‘∼한다더라’ 식으로 나타나는 ‘∼더라’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기사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장문의 기사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인명·지명
표기를 우리식 한자음 읽기로 표기한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山口縣‘은 ‘야마구치 현’이
아닌 ‘산구현’으로 표기했다. 외래어의 경우에는 겹낫표(『 』) 또는 낫표(「 」)를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사회면 기사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平壤署活動
怪日人檢擧
피무든칼기타를압수취됴
京城强盜인嫌疑濃厚
지난달삼십일오전령시경 평양경찰서에서는 돌연이부내황금뎡(黃金町)팔천대관(八千代館)이라는
일본려관을습격하야 어 일본청년한명을 톄포하는동시에 그가가지고잇든 여자의복이잔득찬 큰가방두개와 뎐당표닐곱장
피무든단도두개 쇠ㅅ줄는 집게등속을 압수한후방금 엄중히취됴중인바 아즉자세한 것은 알수업스나 그는자칭일본산구현(山口縣)출생의사옥명작(士屋明作)(三一)으로서지난달이십이일에평양에와서그동안몃곳에서
절도질을 한 것은자백하얏스나 여죄가 만흘듯할아니라 경성에서 강도질을한혐의가 농후하야 취됴를계속중이며 공범이잇슬듯하야
방금수색중이라더라 【평양】(1929년4월2일)
1930년대
1930년대의 문체는 ‘∼더라’체가 ‘∼하였다 한다’ 식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30년1월부터
‘∼더라’가 ‘∼하였다 한다’로 바뀌었다. 이 시기에는 ‘1기사 1문장’에서 벗어나 문장 길이가 짧아졌으며
생략문을 쓰기도 했다. 또 숫자 표기 방식이 한글에서 한자로 바뀌었으며 본문에 노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33년 4월1일부터는 그 해 10월29일(당시의 한글날)에 발표될 예정이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기사 작성에
미리 적용했다. 또 이 날부터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정식으로 도입했다.
一夜享樂에惡疾얻고
三十歲老總角
漢江蒼波에投身
暗澹한貧困의悲劇
호을로 독수공방하든 노총각의투신자살
二十일마포(麻浦)정三六四앞한강에서 지나는행인이익사체하나를발견하고경찰에급보하야소관용산경찰서에서검시조사하야본즉
그는 도화정(桃花町)三一○ 이선춘(李先春)(二七)으로 인생三十고개가 가까워오도록 원수놈의 가난때문에 장가를
못들고 항시셋방에서 홀로 청춘을 한탄으로 지나왓엇다 한다 그러다가 지난달 어느밤은 고적을 못참어 모처럼
향락장에 갓든것이 야속한 운명의 작난이엇든가 불행히도 불치의 화류병을 얻어가지고 돌아왓다 입에풀칠도 뜻대로
못하는처지인지라 병치료를 못하니 병은점점 깊이들어 호구지책이든 생선행상(生鮮行商)도 못하게되매 그와같이
세상을 비관하고 투신자살한 것이 판명되엇다 (1936년8월25일)
광복 이후
1940년 강제 폐간된 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복간된 직후의 기사에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 시기의 눈에 띄는 변화라면 ‘∼는데’라는 접속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하나의 문장에서 보여주게 된 점이다. 또 193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라 한다’ ‘∼하였다 한다’식의
표현과 더불어 ‘∼하였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안(安在鴻)민정장관’
식으로 성만 적은 뒤 괄호 속에 이름 전체를 한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소의 경우 ‘시내 룡산동2가’
‘시내 예저동’ 등으로 적어 전국지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기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天一藥房火災
十三일상오九시경 시내예저동 천일(天一)약방이층창고에서전기누전으로발화하야 건재한약을두었든 二층三층의창고를
소실하고 동十시반경진화하였다는데 손해는 방금조사중이라고 한다 (1947년4월15일)
1960년대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숫자 표기에 비로소 아라비아 숫자를 썼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에 사용되던 ‘∼는데’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대신 모점(′)을 적절히 구사, ‘∼하여’ ‘∼되어’ 등의 어미를 생략하는 기법이 등장했다.
또 문장의 간결성을 꾀해, 아예 서술형 어미 자체를 생략하는 문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동안 한글로 적고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던 인명 지명을 한자로만 적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
초기에는 시 군 구 등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한자로 표기했으나 후반에 들어서는 한글로 표기했다. 후반부터는
고유명사의 영문 두문자(이니셜) 표기 방식(JP, SK 등)이 나타났다.
1967년 7월27일에는 ‘東亞日報社制定 常用漢字 二千字’를 제정했다. 상용한자 제정과 함께 마련된 ‘한자운용요강’은
상용한자 아닌 한자(不常用漢字)는 그 음을 따라 국문자(國文字)로 쓰거나 표현을 바꾸도록 했다. 또 상용한자와
불상용한자가 섞이는 단어의 경우에도 그 단어 전부를 국문자로 쓰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상용한자표채택에
따르는 부대 결정’에서는 ‘점진적으로 상용한자수를 삭멸(削滅)하는 방향으로 한다.’ ‘벽자가 섞인 시군명은
상용한자로 개칭이 고려되도록 여론을 조성한다.’ ‘광고문은… 고유명사 및 불가피한 극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용한자의 범위 안에서 작성하도록 권고한다.’고 명시해 상용한자 제정이 한글 전용으로 가는 기초작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는 물론 광고까지도 상용한자만 쓰도록 권고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한자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 시기의 기사체는 다음과 같다.
鷺梁津水源池職員 電氣대다殉職
28일오후6시반경 서울永登浦구本동258 鷺梁津수원지사무소 「모터」책임자 朴根植(40〓鷺梁津洞山28)씨가
전기 「스위치」를넣다가 감전 현장에서심장마비로순직했다 (1965년7월29일)
1970∼9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며 문장의 대체적인 틀이 체계적으로 잡힌 이후 신문은 좀더 읽기 쉬운 문장을 지향하게
됐다. 그 결과 이전 시기보다 구어체적인 문장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문화·생활·체육·사회면
등에서 두드러졌다. 구어체 문장의 활성화는 외래어 비표준어 비속어의 남용이라는 폐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 60년대부터 나타난 고유명사의 영문 두문자 표기 방식(YS, DJ, DJP, PK, TK 등)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한자만으로 표기하던 지명 인명을 지명은 한글로만, 인명은 한자를
적고 한글을 괄호 속에 병기하게 됐다. 이후 1997년 9월1일부터는 인명의 경우 한글과 한자의 순서를
바꿔 표기하게 됐다. 또 이 날부터 중국의 인명 및 지명을 한국 한자음 표기 방식에서 중국 현지음 표기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98년 1월1일부터 전면 가로쓰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구두점을 가로쓰기 체제에 맞도록 고쳐
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