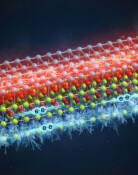서울만한 도시가 하나 만 더 있다면
서울만한 도시가 하나 만 더 있다면
Posted June. 21, 2025 07:53,
Updated June. 21, 2025 07:53
“이재명 정부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달라”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19일 세종시에 모여 이렇게 외쳤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에 반발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부터 신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부산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환영한다”며 부산항 북항을 적합지로 꼽았다. 다른 부처의 해양 관련 업무도 해수부로 옮기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주문한 후 지역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찬성 측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워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대 측은 세종으로 이전한 해수부를 다시 부산으로 옮기면 업무 비효율성 만 커지며행정수도 완성이란 목표에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해수부 하나 이전한다고 얼마나 큰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까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지역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도 이해된다. 부산 인구는 최근 10년 간 20만 명이 감소했다. 수도권으로 옮겨간 부산 청년 인구는 10년 간 10만 명이 넘고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최저 수준이다. 부산 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겪는 현상이다.
해수부의 이전 찬반에는 단순히 1개 부처의 이동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수도권 일극체계와 이로 인한 인구유출, 지역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난제에 내제돼있다. ‘해수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는 질문은 ‘우리나라를 향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란 질문과 동일하다. 역설적으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인 행정수도 완성 역시 수도권에 쏠린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이관해 국토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과 함께 중부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등 ‘5극 3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와 광역단체장을 모두 거친 첫 대통령에 대한 지역의 기대도 큰 편이다.
다만 선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발전을 강조해왔다. 김영삼 정부는 과밀부담금제와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으로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행정수도 등을 시행했고,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으로 지역 산업을 키우려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각 시도에 창조경제센터를 세워 지역을 살리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수십 년 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수도권은 더 거대해졌다. 지방은 더욱더 쪼그라들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 거주 인구는 2604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 이상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516만명에서 87만 명 이상 감소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전체 228개 시군구 중의 57%(130곳)가 소멸위험지역이 됐다. 지방은 청년 취업자 수가 최대 70%나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50.7%)이 몰린 수도권도 몸살을 앓은지 오래다.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로 청년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지난해 2분기 서울 합계출산율은 0.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굳이 통계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돌덩이처럼 굳어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앞으로도 개선될 것이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현 상황에선 허황되게 들리겠지만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도시가 전국에 1곳 만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인구유출, 일자리, 주택, 저출산 나아가 교육문재까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같은 도시가 1개 더 생겨 총 3곳이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도 있다.
균형발전이 절실한 이유다. 개인적으론 균형발전을 고민할때 마다 유럽 특파원 시절 릴, 낭트 등 프랑스 곳곳에서 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기념비들이 생각난다. 기념비에는 미테랑의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이 담겨있었다. 왕정국가, 나폴레옹 시대를 거친 프랑스는 모든 권한이 파리에 집중돼 유럽에서도 중앙집권의 전형이라 불렸고 국가 발전을 저해할 정도였다. 이에 좌파 미테랑은 기득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했고, 1982년 관련 법안까지 마련했다. 미테랑 전 대통령 뒤를 이은 우파 성향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2003년 개헌을 통해 ‘프랑스는 분권화(dcentralise)된 공화국’이라고 명문화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헌법으로 보장됐다. 이에 맞춰 프랑스 각 지역은 특성에 맞게 발전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우리도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선 지방 재정자립도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5% 내외에 불과하다. 일명 ‘3할 자치’ 탓에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 등에 의존하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지방세 비중이 45∼55%에 달한다. 자방세 비율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스처럼 헌법에서 지방자치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넣는 식이다. 지방분권 강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은 지역에선 꾸준히 요구돼왔다.
올해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30년 간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발전을 이룬 긍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렸다. 수도권 중심의 현 체계로 한계에 달한 우리에게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