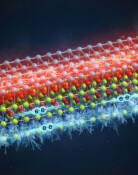[오피니언] 명동의 국립극장
네다섯살 때부터 여성국극을 많이도 봤어요. 김진진 조금앵그분들을 보면서 참 근사하다, 나도 하고싶다고 생각했죠. 가장 한국적인 어머니상으로 꼽히는 배우 김혜자씨의 얘기다. 그가 어른들 등에 업혀 구경하던 곳이 서울 중구 명동의 옛 국립극장(현 대한종합금융 소유)이었다. 꼬마가 뭘 알까 싶어 어린이의 능력을 무시하는 어른이 꽤 있지만 어린 날의 좋은 문화 경험은 그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때 만일 명동 국립극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만한 여배우를 갖지 못할 뻔했다.
어린 시절뿐이랴. 예민한 사춘기 때는 물론이고 먹고사느라 바쁜 성인기에도 감동적인 문화 한 모금은 팍팍한 일상에서 오아시스로 다가온다. 문제는 그 문화의 요람이 우리 생활의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굳이 미국 뉴욕의 맨해튼 중심부에 자리잡은 링컨센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공연장은 일단 번화가에 똬리를 틀어야 한다. 그래야 오며가며 들를 수 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서울 서초구 서초동)이나 국립극장(서울 중구 장충동)은 큰 맘먹지 않고는 가기 힘든 자리에 버티고 있다.
이에 비해 명동의 옛 국립극장은 서울 한복판이라는 그 위치만으로도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지녔다. 게다가 지금 명동은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몰리는 새로운 다양성의 거리로 다시 빛나고 있다. 젊은 유행패션은 물론이고 세련된 음식점과 멀티플렉스 극장, 심지어 대형전자오락실과 첨단전자제품 매장까지 들어서 멋과 맛, 그리고 재미의 발신지로 떠올랐다. 5월엔 명동성당 문화관 자리에 음악당 꼬스트홀도 문을 열었다. 여기에 1957년부터 18년간 공연예술의 메카 역할을 했던 옛 국립극장이 부활한다면 명동은 감동까지 안겨주는 문화 르네상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
옛 국립극장이 75년 당시 대한투자금융에 팔리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의식해 대규모로 지어진 장충동 국립극장으로 옮겨갔던 건 문화 명동의 상징적 죽음이요, 이데올로기 우선의 시대적 비극이었다. 이제 문화관광부가 이 옛 국립극장 건물을 사들여 공연장으로 되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건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건물 구입비 400억원을 따내는 일이다. 이번만은 문화의 향기가 경제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전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먹고 놀기 위해 명동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냄새나는 연극 한 편으로 마음까지 풍요로워져 돌아간다면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는가.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