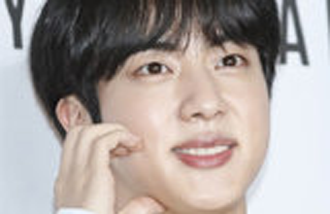[오피니언] 국가 석학()
러시아 수학자 페렐만은 2003년 밀레니엄 수학 문제 중 하나인 푸앵카레 추측을 풀어 인터넷에 결과를 공개한 뒤 잠적했다. 이 공로로 그는 올해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수상자로 지명됐으나 상을 거부해 더 유명해졌다. 한국에도 이런 난제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풀어 낸 수학자가 있다. 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는 15년간 복소기하학의 난제였던 라자스펠트 예상과 40년간 학자들을 괴롭혔던 변형불변성의 증명을 해결했다.
제2회 국가 석학에 황 교수를 포함한 10명의 과학자가 선정됐다. 올해는 수학과 지구과학 분야가 추가돼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과학논문인용색인(SCI) 피인용 횟수가 4393건에 이르는 임지순 교수, 편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를 비롯해 여러 미해결 이론을 증명한 채동호 교수, 세포신호전달체계 연구를 선도하는 최의주 교수 등 쟁쟁한 과학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됐다.
국가 석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과학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황우석 신화가 무너지면서 과학 한국의 꿈을 이대로 날려 버릴 수는 없다는 공감대에서 도입됐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이론 분야 1억 원)이 지급되며, 필요하면 연구 기간을 5년 연장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성과를 바로 내야 하는 두뇌한국(BK)21 사업과는 달리 장기() 연구의 자율성도 높다.
외국의 스타 패컬티(star faculty)가 국가 석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국가 석학이란 명칭에는 노벨상에 대한 염원과 압박이 배어 있다. 하지만 노벨상은 장비와 재료를 넣어 기계만 돌리면 뚝딱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다. 두터운 기초과학 연구 역량과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니 이들에게 노벨상을 얼른 받으라고 닦달할 일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국보급 인재인 이들을 속 편하게 잊어 주는 것이 거꾸로 이들의 노벨상 접근을 돕는 길이 아닐지 모르겠다.
정 성 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Headline News
- Pyongyang’s trash provocation makes Seoul consider loudspeaker broadcasting
- Two Korean Americans win prizes at Queen Elisabeth Competition
- Tech firms including Google, Intel form anti-Nvidia frontline
- Biden suggests cease-fire plan to end war
- Kim Woo-min wins gold in men’s 400m freestyle in personal bes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