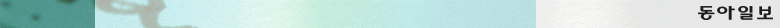3
이미지에서 끌어올려지는 서사의 세계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그 긴장의 세계가 현실과 멀어져 갈수록 상상력은 소통에 더 주력하고자 한다. 가상의 현실은 그 소통의 공간에 배치된다.
가끔 허구는 실제 사건보다 더 쉽게 이해된다. 실제 사건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구차해질 때가 많다. 그때그때 대화에 필요한 예화들은 만들어 쓰는 게 편리하다는 것을 아주 어릴 적에 배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즐긴다. 어차피 허구로 가득한 세상이다.(61쪽, 굵은 글자는 필자의 강조표시임)
실제와 허구의 거리를 무시해 버리는 태도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소통의 대상을 염두에 둔다. `허구로 가득한 세상'에 소설은 `말짱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설 속의 공간은 역설적으로 진실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을 확보하는 장소이다. 이는 다시 `허구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직설적 드러냄의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이미지로부터 얻은 소통에 관련한 모든 것은, 자유로운 반면 현실에 견제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가상의 공간이 의미있는 것은 단지 소통의 사적인 경험으로서이다. 이것은 곧 소설의 묘미로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 현실의 공간과 실제 현실의 공간이 만나는 지점, 즉 독자의 현상학적 사유가 머무는 공간이 긴장을 잃어버린다면 이 소설은 대중소설로 전락할 위험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이것은 소재가 주제를 압도해 버리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설이 독자들로부터 주제와 관련한 반성적 인식을 이끌어 내지 못할 때 소설은 마냥 순진한 유희적 글쓰기로 전락한다. 김영하 소설의 성과로서 언급되는 `나르시시즘'이 그럴듯한 주제로서 문제화되고 반성적 인식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의 소재로 전락하고 마느냐는 김영하의 소설이 마련한 소설적 공간이 실제 현실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확보하는 수준에 달려 있다. 이미지가 자기자신의 순수한 시뮬라크르 라 할지라도 회화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한 `가상 현실'은 순전한 가상일 수 없다. 이미지가 서사화할 때는 현실의 `체계'에 기반해야 하는 까닭에 그것은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영하의 글쓰기가 `시각 이미지의 소설적 착종'으로 확보한 가상의 세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가상 현실의 공간, 즉 이 소설의 공간은 너무나 순진한 허구이기에, 자신의 속임수에
철저히 거짓말을 할 경우에만 그것이 사실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들을 설득시키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세계를 성공적인 문학적 형상화로 가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세계가 타당성이 뒷받침된 진실을 담보하고 있을 때이다. 김영하의 장편이 그 진실로서 삶에 대해 `죽음(자살)'이라는 기제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 타당성은 희미하고 모호하며 제명의 도발성에 비추어 부실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마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이유없이 비행기를 쳐부수는 것과 같다. 죽음에 이르는 등장 인물들이 삶을 거부하는 것은 `권태' 때문이다. 이 일상적 감정에 대한 극복은 오직 `삶에 대한 극단적 거부'로서만 시도된다. 작가는 죽음 혹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전망만을 오직 실존의 에피파니로서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두 개의 액자와 액자의 밖, 세 편의 에피소드들은 한결같이 주체의 죽음을 서술하지는 못한다. 유디트와 미미의 죽음은 자살 안내업자의 시점으로 옮겨가서 형상화될 따름이고, 자살 안내업자는 한 장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할 수 있을 뿐이다. 목전의 죽음에 이르러 `왜 멀리 떠나가도 변하는 게 없을까' 따위의 건방을 떠는 그는, 결코 멀리 떠나오지 않았다. 끝내 죽음 그 자체를 서사화할 수는 없었기에 그것은 그러하다. 죽음은 그저 한 장의 그림으로 이미지화할 뿐이다. 이처럼 이미지에서 출발한 세계가 끝내 이미지로밖에 환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그의 의뢰인과 다름없이 죽음에 자신을 내맡길 뿐인 자살 안내업자의 운명이자 작가의 한계이다. `나를 파괴할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은 이미지에서 출발한 서사적 구조물에 대한 한계, 그리고 서사화하는 이미지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마치 파스텔톤의 직조물처럼 갖가지의 원사가 서로 규칙적으로 교차하며 일구어 내는 이미지처럼 보인다. 소설적 공간에서 이미지가 담지하는 것은 결국 모방적 서사이며 언제나 되묻는 근원적 물음이다. 이 물음은 소통의 형식, 곧 소설의 형식이라는 직조물과 그것을 가로지르는 주제라는 또 하나의 직조물이 교차하며 형상화된다. 여기에 그것들이 교차하는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는 셈인데, 바로 소설의 형식이자 주제이며 문체이기도 한 그 교차선의 형상화는 앞서 밝힌 것처럼 가상 현실의 공간을 빌어 이루어진다. 하나 하나의 원사들이 가진 이미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는 현실의 체계를 닮고자 하지만, 서사의 얼개가 흐릿하게 짜여져 마치 쓰러져 가는 허상의 세계처럼 보인다. 등장 인물들의 휑뎅그렁한 죽음만이 난무하는 이미지의 자기도취는 소설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절제를 모른 채 독자를 도발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제명은 작품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 보이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