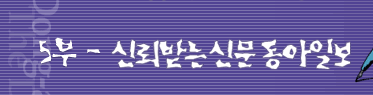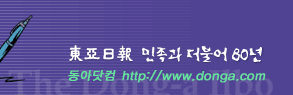| |
1. 제2창간 선언
1986년 9월 어느날 서울의 안기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 사람은 동아일보 김병관 부사장, 다른 한 사람은 장세동 안기부장.
장세동 부장의 요구로 마련된 자리였다. 장부장은 앉자마자 막말로 나왔다.
“김병관 부사장 당신,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식으로 보도해 돈 벌어서 그 돈 관속에 갖고 들어갈 작정이오? 당신, 이 자리에서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소.”
아무리 안기부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이긴 해도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그가 이처럼
막보기로 나온 것은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불만 때문임은 물론이다. 중공기 불시착 보도와 재산세
파동 보도 등으로 정부가 번번이 코너에 몰리던 때였다.
중공기 불시착 보도는 85년 8월24일 전북 이리 근처에 불시착한 중공 경폭격기의 생존 승무원
처리방침에 관한 기사다. 안기부는 이 기사가 엠바고(보도시간 제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채주
편집국장, 이상하 정치부장과 김충식 기자를 연행했다.
재산세 파동 보도는 86년 5월 기습적인 재산세 인상과 문제점, 정부의 파행을 파헤친 특종기사다.
연일 이어지는 추적보도로 벼랑 끝에 몰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당초의 방침을 백지화했는데 이
바람에 5공은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 장부장의 폭언은 이참에 단단히 겁을 줘 동아일보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이 무렵 항간에는 ‘내년 초에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고
정국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기에 동아일보는 때맞춰 나온 장세동의 폭언을 ‘사운이
걸린 위기’로 판단했다. 정부의 비위를 맞춰 안주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끝까지 필봉을 휘두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동아일보는 87년 4월1일 부사장 김병관을 발행인에 전격 선임했다.
|
|
김상만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미래의 사주인 그를
일선에 내세워 언제 터질지 모를 전면전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인촌(仁村)과 일민(一民)에
이은 화정(化汀) 시대는 이처럼 핍박속에서 막을 열었다.
따지고 보면 화정의 가시밭길은 그가
동아일보에 처음 몸을 담은 때부터 시작됐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성방직과
동아제약을 거쳐 동아일보에 입사한 68년, 신동아 필화사건이 터졌다. 그 후 세계 언론 사상
유례가 없는 광고탄압을 겪었고 동아사태에 이어 ‘민족의 소리’ 동아방송마저 빼앗기게 된다. 제3공화국
철권정치와 3선개헌, 10월 유신과 10·26사태, 광주 민중항쟁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화정은 이 고난과 질곡, 질풍노도의 한가운데 서서 동아일보를 이끌어야 했다.
인촌이 일제하에서 민족언론을 통해 독립의식을 고취했다면 일민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교육 언론 문화사업에 평생을 바쳤다. 화정 시대에도 인촌과 일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다. 여기에
화정은 한 가지를 더 보탠다. 21세기 문명사적 미래를 조망하면서 ‘독자와 함께 역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길을 여는 것이다.
이는 95년 중국 이붕(李鵬) 총리와의 한국언론사상 첫 단독회견, 중국 최대신문 인민일보와의
제휴 및 동북아시아 미래를 위한 각종 심포지엄, 98년 민족화해를 위한 방북, 그리고 동아일보를
21세기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키우기 위한 미디어센터 건립과 신정보 시스템의 도입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동아일보 창간정신도 새롭게 태어난다. 독립의 밑거름이던
민족주의는 화합과 재통일 및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틀로, 민주주의는 반제국주의 반독재의
소극적 저항을 뛰어넘어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적극적 실질적 개념으로, 문화주의는 단순한
계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질을 꽃피우는 열린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89년 제2창간 선언으로 구체화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