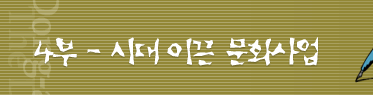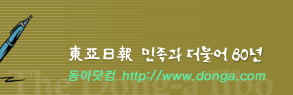| |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서울공연엔 120명
전 단원이 내한해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글링카 등 소련출신
작곡가와 베토벤, 멘델스존, 라벨의 주옥 같은 작품을 연주했다. 특히 6차례의 연주 마지막 날인
9월21일에는 국내합창단 170명과 국내성악가 4명 등 300여 명이 출연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무대에 올렸다. 지휘자 키타옌코는 특별히 ‘합창’을 연주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유와 휴머니티,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곡이 평화로운 올림픽과 전 인류를 위해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
3. 국악의 뿌리찾기
1990년 9월 창극 ‘아리랑’이 소련 무대에 올랐다. 출연진은 조상현, 김일구, 신영희,
박양덕, 김수연, 강형주, 김영자, 김경숙, 윤문식, 이승철 등 내로라하는 국악인·연극인 70여
명. 동아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 순회 공연물은 겨레의 가슴속에 흐르는
서정과 한(恨)의 가락인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일제
침략 때 연해주로 떠난 이민 1세대의 얘기로부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2세대의
아픔, 그리고 고국을 찾은 3세대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회상… 아리랑의 주인공은 바로 중앙아시아
교민들이었다.
모스크바 소브레매니크 극장에서 막을 올린 첫 공연에는 800여 명이 모였다. 대부분 교민이고
소련인 관객도 드문드문 섞인 객석에서는 쉴새없이 한숨이 터져 나왔고 눈물을 찍어내는 관객도 있었다.
공연진이 아리랑을 부를 때는 객석에서도 같은 가락이 흘러나왔고 분단을 극복하자는 피날레 장면에서는
5차례나 기립박수가 터졌다. 몇몇 교민은 이 대목에서 울먹이며 “통일”을 외쳤다.
12일간 타슈켄트 알마타 등 9개 지역을 돌며 공연이 계속되는 동안 객석의 동포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신과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 망국의 한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조국의 분단을 가슴아파했다.
카자흐에서 가장 큰 국립 아카데미야 가극 및 발레극장 공연 때는 동포들만으로 극장이 찼다.
|
|
동아일보가 창작 창극을 무대에 올린 것이 이게
처음은 아니다. 86년에는 지령 2만 호 돌파 기념사업의 하나로 ‘윤봉길 의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했고 87년 ‘임꺽정’, 88년 ‘전봉준’, 89년에는 ‘홍범도’를 차례로 무대에 올렸다.
‘윤봉길 의사’는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하기까지 행적과 의거를 주제로 삼아 제13회
명인명창 공연으로 꾸몄다. 출연진은 박동진, 묵계월, 안비취, 이매방, 조상현, 오정숙, 성창순
등 인간문화재와 국악계의 중진들. 여기에 동아국악콩쿠르 입상자까지 모두 300여 명이 출연했다.
서울과 대전에서 공연한 ‘윤봉길 의사’는 이 해 12월 국립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가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임꺽정’은 천대받는 서민의 편에 서서 양반에 대항하는 의적을 그렸다. 동학혁명 지도자의 일대기를
그린 ‘전봉준’은 조상현, 오정숙 등 인간문화재와 국립창극단, 극단 민예, 홍금산 무용단, 동아국악콩쿠르
입상자 등 100여 명이 출연해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전주, 광주에서 공연을 가졌다.
‘홍범도’는 일제시대 전설적인 독립군 장군의 생애를 그린 창극이다. 홍범도는 사냥꾼 출신으로
의병을 조직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 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렸으며 광복 2년 전인 1943년
카자흐에서 사망한 인물이다. 대본은 홍범도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카자흐의 크질오르다에서
연출가 겸 희곡작가로 활동했던 태장춘의 희곡을 원본으로 삼았다. 그러니만큼 홍범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신창극 ‘天命’
‘우리의 것’인 국악을 진흥하고 미래의 민족문화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동아일보의
사시인 문화주의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국악진흥의 기치를 내걸고 벌여온 명창명인대회, 완창 판소리
발표회, 판소리 유파발표회와 동아국악콩쿠르는 모두 그런 사업이다.명창명인대회는 62년 4월11일
지금은 불타 없어진 서울 시민회관에서 막이 올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