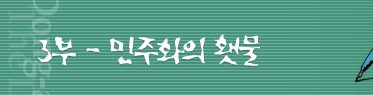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5.
‘작은 거인’
1919년 3월1일 이른 새벽. 전북 무안군 줄포면 줄포리 뒷산 태목봉을 한 소년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오르고 있었다.
이른 봄이라고는 하지만 얼굴에 닿는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소년은 궁금했다.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오르자는 것일까? 그것도 이렇게 이른 새벽에…’ 그러나 할아버지는 산봉우리에 다
오를 때까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이윽고 정상에 이른 할아버지는 북쪽을 향해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했다. “이렇게
북쪽을 향해 서라.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큰절을 해라.” 할아버지는 원파(圓坡) 김기중(金祺中)옹,
소년은 아홉 살 난 상만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선왕조의 종묘와 사직이 있는 북쪽을 향해 세 번 큰절을 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기원했다. 소년도 할아버지를 따라 세 번 절을 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무엇을 기원했는지 알 수 없었다. 소년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였다. 절을 하던 그 날은 바로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무엇을 기원했는지 분명하다.
소년은 그때 할아버지에게 받은 감동을 평생 잊지 않았다.
33년 11월, 23세의 청년 김상만은 영국으로 건너간다. 당시 그는 중앙고보(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주오(中央)대학 1학년에 다니다가 ‘불온단체’인 비밀독서회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한 달 남짓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였다. 그가 영국행 배에 오른 것은
아버지 김성수의 뜻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국의 검소한 신사도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김상만은 그로부터 3년간 런던대학(LSE)에서 유학한 뒤 돌아와 40년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다. 일민(一民) 김상만. 그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5척 단구의 그를 ‘작은 거인’, 또는
‘위대한 평민’이라고 불렀다.
49년 동아일보 이사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딘 그는 22년이 지난 71년 2월 사장이 됐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철권통치 아래 언론이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었고 대학가에서는 언론의 무기력함을
규탄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즈음이었다.
|
|
동아일보
기자들은 일민의 사장 취임 직후인 4월15일 ‘언론자유 수호선언’을 한다.
자유언론의 일선 담당자인 우리는 오늘의 언론 위기가 한계상황에 이르렀음을 통감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자유가 어떤 압력이나 사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엄숙히 선언한다. …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기관원의
상주나 출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신문 및 방송의 제작·판매의 전 과정은 언론인의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의 언론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외부로만 전가하려 하지
않으며 권리 위에 잠잔 스스로의 게으름을 반성하려 한다.…
‘자유의 금펜상’
박정희 군사정권, 그리고 80년대 신군부에 이르기까지 독재정권과 일민의 기나긴 싸움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인촌 시절 동아일보가 저항했던 상대는 일제 총독부요, 식민지 체제였다. 그때의 적은 밖에 있었다.
일민 시절 동아일보가 저항한 상대는 유신체제요, 군부의 독재권력이었다. 적은 안에 있었다. 군부
독재와 싸우던 동아일보는 일제 총독부도 감히 하지 못하던 광고탄압까지 받았고 그것을 이겨내며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신문으로 떠오른다.
광고탄압이 한창이던 75년 2월 초 김상만 사장이 ‘자유의 금펜상’ 후보로 선정됐다는 전문이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EJ)로부터 날아들었다. ‘자유의 금펜상’은 매년 전세계에서 글이나 행동으로
언론자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언론인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상 가운데 하나다.
전문은 ‘1월에 열린 FIEJ 집행위원회에서 김상만 사장과 그리스의 브라디니지 발행인 G.아타나시아데스
등 3명을 자유의 금펜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상만 박사 귀하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FIEJ의 집행위원회는 동아일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들었으며 김박사와 전체 편집진에 위원회가 갖는 깊은 관심과 충심어린 지지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