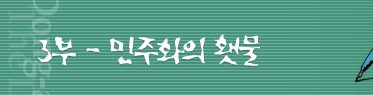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4. 회갑맞은 신문
1981년 1월1일부터 언론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국내 언론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언론의 공적·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자유는 극도로 제약받는 풍토 속에서 언론의
비판적인 기능과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기사는 정치성을 배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동아일보는 경영진을 대폭 개편하며 ‘동아 부흥의 해’를 다짐했다. 이 해
2월24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는 김상만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대표이사 회장에 이동욱
사장, 대표이사 사장에 김상기(金相琪) 부회장을 선임했다. 신임 김상기 사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보성전문을 거쳐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뒤 57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출판부장, 업무국장,
방송국장, 부사장을 역임하고 78년부터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은 한 판의 싸움으로 끝나는 전투가 아니라 지구전”이라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꾸준하고 의연하게 전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82년에 접어들면서 한미수교 100년 기념 공동조사와 새해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가 지면을
장식했다. 동아일보가 미국 갤럽사와 함께 미국 전역의 주민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인의 안보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해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는 고려대 부설 통계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제5공화국 출범 2년째를 맞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82년 두 가지 사건을 보도해 지면을 빛낸다.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어음 사기사건과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사건이 그것이다.
특히 어음 사기사건 보도는 이를 축소하려는 당국의 기도에 맞서 사건 배경을 보도하며 난마처럼
얽힌 권력형 비리의 실상까지 철저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동아일보 취재력의 결정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대화산업 회장 이철희와 이 회사 명예회장 장영자 등 부부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
|
그러나
취재 결과 이들 부부는 대화산업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기업을 상대로 한 엄청난 어음사기와 은행의
편법대출로 거액을 모았으며 이 돈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사채놀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관련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져 1조 원이 넘는
사채시장과 제2금융권을 마비시켰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면 빛낸 특종들
동아일보는 사건을 어물쩍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기도에 쐐기를 박고 권력형 비리가 얽힌 대규모 어음사기임을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형무형의 압력을 뿌리치고 이·장 부부사건을 집중 보도해 5월8일자부터
25일자까지 일요일 휴간을 뺀 보름 동안의 보도량이 1면톱 11차례, 사회면톱 7차례 등 146건이나
됐다. 또 사설 11회, ‘그게 이렇지요’ ‘동아시론’ 등이 8회에 걸쳐 이 사건을 담았고 시리즈
‘장여인 광풍’은 10회를 연재했다.
동아일보의 집요한 추적 보도로 이·장 사건은 이종원(李鐘元)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 교체,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 해임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왔고 한 달 후에는 유창순(劉彰順)
국무총리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권력층의 부조리와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사건으로 5공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을 권위주의 체제로 지탱하면서 내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순식간에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7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졌다.
정구종(鄭求宗) 도쿄특파원이 보낸 ‘일본 개편 고교교과서, 침략역사 미화’라는 기사가 그 시작이었다
새로 개편한 교과서 가운데 한반도와 중국 침략을 다룬 단원에서 종전의 ‘침략’이라는 표현을 ‘진공’으로,
‘탄압’을 ‘진압’으로, ‘수탈’을 ‘양도’로 바꾸는 등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유도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이 기사를 본 일본언론은 정부를 비판했고 중국의 인민일보(人民日報), 소련의 대일방송도 일본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내 다른 신문들도 동아일보의 첫보도가 나간 열흘 뒤부터 머리기사로 다루기 시작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