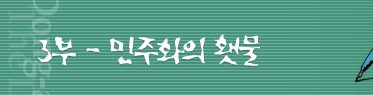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3. 언론인 숙정과 통폐합
1979년의 10·26사태가 권력재편 과정으로 정리되고 있던 1980년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격동을 몰고 왔다.
그리고 언론계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다. 신군부는 언론 감독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언론기본법과
홍보조정실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80년의 언론 대학살’로 불리는 언론인 대량해직과 언론기관 통폐합은 바로
언론장악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자 미리 계획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해 7월로 접어들면서 검열거부와 제작거부에 앞장섰던 기자들을 포함해 반체제 언론인들을 숙정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현실로 나타난다.
문화방송·경향신문의
이진희(李振羲) 사장이 전 사원에게서 사직서를 받아 1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97명을
해고했다.
KBS도 19일 1차 해직자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중순까지 8차례에 걸쳐 일반직 사원을
포함해 140명을 해고했다.
문화방송·경향신문과 KBS의 ‘숙정’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통신협회는
29일과 30일 각각 임시총회를 열어 ‘언론 자율정화 및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실천목표는 언론의 국익 우선, 사회정화에 대한 언론계의 참여, 새로운 언론풍토 조성, 언론인
재교육 등 4가지였다.
‘이에 따라 8월2일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이 기자 아나운서 등 32명을 해직한 것을 시작으로 8월4일에는
합동통신, 8월9일에는 동아일보, 8월10일에는 한국일보가 뒤를 이었다. ‘기자숙정’ 작업은
그 신속성이 시사하듯이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한국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이 언론인 대량해직의 ‘숙정기준’은 첫째 반체제 용공불순분자 또는 이들과
직·간접으로 동조한 언론인, 둘째 검열거부와 제작거부에 앞장서거나 이에 동조한 언론인,
|
|
셋째 부정부패한 언론인, 넷째 특정 정치인·경제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언론인, 다섯째 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는 언론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부패언론인은 지탄을 받고 숙정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이른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특히 언론검열 거부에 앞장섰던 기자협회 집행부를 비롯해 각 기협분회 간부 대부분이 해직자 명단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권력이 보복을 위해 숙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는 추리가 가능하다.
동아일보에서는 33명이 의원해임 형태로 강제해직됐다. 신군부는 자율숙정이라는 편법 아래 이처럼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7월31일 ‘주간국제’와 ‘주간부산’ 등 주간지 15개, ‘월간중앙’과
‘월간전해’ 등 월간지 114개,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 등 계간지 16개를 포함한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도 취소했다.
44개 언론사 통폐합되다.
신군부가 언론인 대량해직을 감행한 것은 언론의 검열거부운동이 학생시위와 더불어 자신들의 정치
스케줄에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 일련의 언론정책을 강행하기에 앞서 ‘저항의 싹’을 자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군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다.
5·17 직후에 이루어진 7∼8월의 언론인 대량해직, 11월의 언론통폐합 등 신속하고도 단호한
언론조치는 이와 같은 신군부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 통폐합은 언론정책의 마무리 과정인 언론기본법 제정에 앞서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장악 작업이었다.
이는 또 정통성 없는 5공정권 유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기도 했다
80년 8월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은 11월12일 ‘언론창달계획’을
결재했다. 내용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조간은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석간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만 남기고 신아일보를 경향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