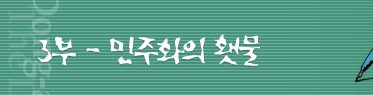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를 단행, 심의실과 편집국 기획부 과학부, 출판국의
출판부 등 4개 부서를 폐지키로 했다. 4월1일부터는 주 48면을 40면으로 줄이고 임원 20%,
국장급 10%, 부장급 5%, 차장급은 3%씩 임금을 깎았다. 동아방송도 4월7일부터 방송시간
21시간 중 1시간30분을 줄여 심야방송을 중지했다. 경비절감을 통해 경영난을 타개하고 지구전에
대비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5월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자 독자들도 더는 격려광고를 낼 수 없게 되었다. 격려광고가
사라진 동아일보 지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중앙정보부가 “정부에 사과하는 내용의
사설이나 성명을 실으면 광고탄압을 풀겠다.”고 은밀하게 제의해왔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살
길이 트이는 터였다. 제의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유혹을 뿌리쳤다.
광고탄압으로 정부도 큰 타격을 받고 있었다. 광고탄압을 비난하는 세계여론이 비등해 국가 위상이
크게 손상되는 바람에 정부 고위당국자들까지 “광고탄압을 더 끌고 가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한 달간의 승강이 끝에 7월15일 밤 드디어 동아일보사와 중앙정보부가 합의했다. 정부에 대한
사과성명이나 사설 대신 ‘긴급조치 9호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그동안 동아일보는 단호했다. 정부도 이를 눈치채고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물러나기로 작정했던 것
같다. 이로써 실로 7개월 만에 광고탄압은 가까스로 막을 내렸다. 광고탄압 기간에 동아일보에
실린 격려광고는 1만351건이었고 판매부수는 오히려 12만 부가 늘었다.
5. 동아사태
7개월에 걸친 광고탄압은 자유언론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권의 ‘계획된 테러’였다. 온국민의
성원을 등에
|
|
업고 이 음모를 끝내 돌파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서슬퍼런 유신 치하에서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자유언론실천이 언론인의 무더기 해직으로 이어진
동아사태는 동아일보의 역사, 아니 한국언론사를 통틀어 큰 비극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언론탄압에 저항한다는 대 명제는 같으면서도 단지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에 비롯된 불행이었다.
75년 3월12일 오전9시, 동아일보 광화문사옥 3층 편집국에서 긴급 기자총회가 열렸다. 편집국·방송국·출판국
소속 기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유언론 실천백서와 결의문 등 두 가지를 채택했다. 백서는 ‘정부가
동아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이 성공도 거두지 못한 채 국내외에 물의만 일으키는 역효과로 끝나자
이제 자유언론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기자들을 구조적·제도적으로 제거하려는 이른바 언론유신 작업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계 내부의 이간분열 책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총회는 기자 20명이 해직처분을 받는 바람에 열렸다. 광고탄압 이후 극심해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는 기구축소 감원 등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심의실과 편집국의 기획부
과학부, 출판국의 출판부를 폐지하고 소속 기자 18명을 해임했다.
어제까지만해도 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이 날 권영자 문화부 차장을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 새 분회장으로 뽑은 자유언론실천특위는 소식지
‘알림’을 통해 이렇게 건의했다.
…이번 기자들의 집단해직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동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