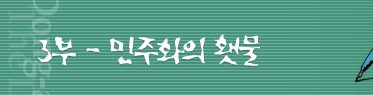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수석심의위원으로, 손세일은 같은 해 4월 편집국
기획부장으로, 천관우는 70년 2월 이사로 선임돼 돌아왔다. 신동아 사태의 상처가 조금은 아문
셈이었다.
2. 국민 사랑 속에 성장
1967년 4월1일 창간 47주년을 맞으면서 동아일보 임직원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이
날 발행부수는 총 52만3000부로, 드디어 50만 부를 돌파한 것이다. 한국신문사상 처음인
경사스러운 기록이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양주를 통틀어 동아일보가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했다.
30만 부를 돌파한 때가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56년 여름, 40만 부를 넘어선 때가 대통
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 63년 가을. 그로부터 4년이 채 안 돼 다시 50만
부를 돌파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발행부수 50만 부를 넘는 대중매체로 성장하면서 편집방향에 대한 논쟁도 자연 스럽게
불붙었다. 독자가 읽어야 할 것을 취사선택해서 보도 논평하는 고급지 또는 권위지 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소재에 치중하는 대중지의 길을 택할 것 인가 하는 논의였다.
서구 사회에서는 고급지와 대중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국내 신문은 대개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
다만 동아일보는 ‘민족의 표현기관’ ‘민주주의의 지지’라는 창간정신이 이어져 차별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독자가 늘면서 독자층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더 읽기 좋은 신문, 더 친절한 신문,
더 재 미있는 신문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했다. 66년 4월 열린 동아일보 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을
살 펴보자.
“신문이란 저널리즘의 첨병이므로 아무리 영양분이
|
|
많아도 먹여주지 않으면 쓸모 없다는 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를 끌고 나갈 기획이 필요하다.”(이동욱 의장)
“우리 신문은 고급지와 대중지의 성격을 다같이 풍기고 있다. 흥미위주의 센세이셔널리즘이 강한가
하면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보수적인 제작방침 등 고급지의 성격도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개발하는 데 신경을 덜 쓴다.”(박권상 위원)
“양자를 겸비해야 한다. 지금 동아일보에 읽을거리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 타락할 수는 없지 않은가.”(오병헌
위원)
“실천이 어렵다. 인기배우의 이혼 등을 안 싣거나 줄이면 읽을 거리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봤더니 편집국에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 다시 중단했다.”(김성열 편집국장대리)
“특히 3면은 성문제와 범죄사건으로 늘 어두워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좀 더 밝은 지면을 보여줬으면
한다.”(김상만 부사장)
“밝은 지면을 위해서는 사회부원의 배치를 달리해야 한다. 현재는 주력이 경찰 검찰에 나가고 있으니
자연히 나오는 기사가 그럴 수밖에 없다.”(천관우 주필)
대중지로 갈 것인가, 고급지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도 정책회의 심의회의 등에서 자주
거론됐다. 주 48면으로 증면을 앞두고 70년 2월에 열린 정책회의에서 고재욱 사장은 동아일보의
방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개 지침을 내걸었다.
첫째,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뉴스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할 것.
둘째, 신문의 권위는 폭력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의식적인 과장·왜곡·조작은 언론의 폭력이므로
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