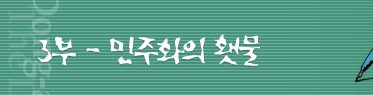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1. 탄압과 저항
한국언론사는 1968년의 신동아 사태를
한국언론에 조종(弔鍾)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한다. 정부의 집요한 통제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해오던
언론과 정부 간 균형의 추가 이때를 분수령으로 급격히 기울었기 때문이다.
64년의 언론파동 때 단합된 힘으로 박정희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를 일단 무산케 했던 한국 언론은
이후 차츰 힘을 잃었다. 탄압을 당해도 공동대처보다는 눈치보기에 바빴다. 편집인협 회나 기자협회의
대(對)정부 항의성명 기사도 동아일보 외에는 거의 싣지 않았다.
이러니 동아일보는 박정희 정권에 불편한 존재였다. 더욱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3선개헌 시 나리오까지
짜놓은 그들로서는 동아일보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신동아 사태는 그러한 음모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언론이 다시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신호이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신동아 사태가 터지기 한 해 전인 67년부터 이미 내리막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이를 앞세운 조직적인 홍보활동, 방대한 정 치자금의
살포와 조직의 강화 등은 곧 권력의 강화와 비대로 나타났고 공화당은 이를 바탕 으로 67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다.
5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유효투표자 중 51.4%의 지지를 얻어 41%의 윤보선 후보
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그리고 6월8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타락과 부정으로 얼룩졌다. 김 병삼(金炳三·공화당)과
김대중(金大中·신민당)이 맞선 목포는 최종 유권자 수가 8만3000 여 명으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한 달 사이에 무려 1만2000명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 데 2만여 명은 비거주자인 이른바
‘유령 투표권자’였으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
|
당시 정부와 공화당은 6·8총선에 자신이 없어
보였다. 63년 총선 때와는 달리 야당이 분열되지 않은데다 행정부의 독주를 입법부가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조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에 이기려면 ‘부정’을 동원해야 한다는
여권 내 주장이 자연스레 힘을 얻었다.
국무총리가 행정시찰을 다녀간 뒤 세 트럭분의 보리쌀이 쏟아져 나오고, 교육장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까지
여당후보 지지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여당을 찍으면 판잣집을 헐 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선심행정…. 부정의 양태는 가지가지였다.
개표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102석에 신민당이 28석 민중당이 1석이었고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은 공화당 27석에 신민당이 17석. 공화당은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선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6월12일자 동아일보 사설.
선거는 과연 끝났는가. 선거의 정확한 결과가 온국민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 일반이 주시하는 것은 여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했느냐 또는
야당이 얼마나 적은 의석을 얻었느냐 하는 유의 이야기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의원이라고 버젓이 원내에 들어가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이 난장판 투·개표의 결과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유의, 선거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이는 정치를 넘어서 도의 문제다. 바야흐로 우리의 민주정치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넘어 우리의
도의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때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부, 부끄러움을
아는 정당, 부끄러움을 아는 후보자,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국민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검거선풍 몰고 온 신동아 사태
68년 신동아 12월호에 ‘차관(借款)’ 기사가 실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