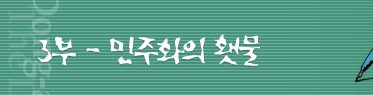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1. 군사정권하의 시련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요란한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깼다. 박정희(朴正熙) 소장이 이끄는 이른바 ‘혁명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해병 제1여단을 선두로 서울에 진입한 3600여 명의 쿠데타군은 2시간 만에 정부청사, 방송
국, 신문사 등 요소를 모두 장악했다. 곧이어 새벽 5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張都 暎)
중장’ 이름으로 5개항의 혁명공약이 발표됐다.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새벽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일체의 옥내 및 옥외 집회를 금하 고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을 시작했다. 4·19혁명의 피의 대가로 탄생한 제2공화국이 불과 열 달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장면내각의 총사퇴와 때를 같이해 군사혁명위원회를 개칭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곧 구호· 학술·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를 해산시켰다.
이때 간판을 내린 단체가 정당 15개, 사회단체 238개. 최고회의는 또 ‘혁명’을 반대하는
언론을 엄금하고 ‘언론·출판 검열방침’에 따른 보도금지 9개 항목을 정하는 등 모든 출 판물에
사전검열을 실시했다. 5월27일 비상계엄이 경비계엄으로 대체되면서 형식상 사전검 열은 사라졌지만
신문제작은 여전히 군정당국의 손아귀에 있었다. 그들은 아예 언론을 자신 들의 선전도구로 삼을
작정이었다. 우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법적인 규제다. ‘정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에게 전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유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
|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3조 3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반공법 4조가
바로 언론을 탄압하는 ‘보검’이었다. 이 두 자루 칼을 빼들면 군사정부를 반대하는 어떤 언론도 침묵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군정초기는 물론 60년대에 일어난 정치적 필화사건 대부분은 이 두 법에 걸린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취재보도를 철저히 제약했다. 군정당국은 6월12일 ‘기자출입 및 취재활동 절차 송부의
건’이라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이는 정부의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취재원 접근을 금지한다는 뜻이었다. 8월4일자 동아일보 ‘8각정’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국장 과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자 만나기를 꺼리고, 심지어 복도에서 마주칠
경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슬슬 피해버리기 일쑤인 실정이다. 기자들 또한 기자실과 화장실 사이만
내왕할 뿐 사전허가 없이는 아무 곳에도 나타날 수 없는 기이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기자실에서
대기하다가 발표문이 있으면 한 부씩 얻어들고 들어오는 것이 요즘 대부분 외근기자들의 생활이다.…
“죽어도 사실은 지키겠다”
신문의 논설 기능도 위축됐다. 군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마다 찬양·지지하거나 아예 침묵할 수는
있어도 반대나 비판은 용납되지 않았다. 반대나 비판은 처벌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였다. 군정 2년6개월
동안 한국언론계 전체가 통제 대상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동아일보에 대한 탄압이 심했다.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인데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자유언론의 기본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우회적으로 드러내보였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