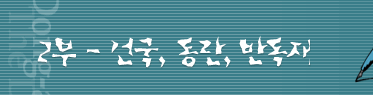| |
1. 피란 신문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아침. 동아일보 사원들은
비상 소집을 받고 신문사로 달려왔다. 군과 중앙청 경찰 외국공관 등에 출입하는 10여 명의 기자들이
얻은 정보로는 사태가 일시적 도발이 아니라 전면전쟁이며 전세는 매우 위급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아군, 적을 격퇴중’이라는 낙관적 발표를 내놓았다.
어수선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인 서울 거리에 우선 공산군의 남침을 알리는 호외를 뿌렸다.
거리에는 군용 트럭이 질주하고 있었다. 편집국원 전원은 대기상태로 밤을 새우면서 시시각각 들어오는
전황과 국제 동향을 계속 호외로 발행했다.
이튿날인 26일 새벽,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고 공산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물밀듯 쳐내려온다는 급보가
속속 들어왔다. 27일 남침 선봉대는 이미 의정부를 거쳐 미아리 부근까지 육박했으며 서울 주재
외국기관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 날 아침 최두선 사장은 전사원을
소집한 자리에서 ‘일단 해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은행예금을 모두 찾아 전사원에게 나누어주었다.
오후 4시경. 서울 동북과 서북 방면에서 포성이 울려퍼지고 피란 농민들이 우마차를 끌고 서울
시내를 통과해 남으로 향하는 가운데 몇몇 기자가 마지막 호외를 내기 위해 편집국에 모였다. 전황은
절망적인 것이어서 더 이상 취재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텅 빈 공장으로 내려가 호외 발행을 서둘렀다. 인쇄담당 직원들은 모두 흩어진 가운데 취재기자와
간부 일부만 남아 직접 조판을 했다.
외국기관을 출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정인영(鄭仁永) 기자가 일본 유학시절 식자공(植字工)으로
아르바이트한 경험을 살려 간신히 문선 작업을 끝냈다. 그러나 조판을 할 공원이 없어 공무국장
이언진(李彦鎭)이 직접 매달렸다.
이렇게 해서 수동기계로 찍어낸 300장 가량의 호외는 ‘적, 서울 근교에 접근, 우리 국군 고전
혈투중’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
|
기자들은 자기 손으로 찍은 이 마지막 호외를
서울시경에서 빌린 지프로 서울 시내 일원에 직접 배포했다.
그리고 기자들은 인근 무교동 설렁탕집 ‘실비옥’에 모였다. 이언진 장인갑(張仁甲) 이동욱(李東旭)
조인상(趙寅相) 변영권(邊永權) 김성열(金聖悅) 권오철(權五哲) 최경덕(崔慶德) 김준철(金俊喆)
김상흠(金相) 최흥조(崔興朝) 김호진(金浩鎭) 정인영 백광하(白光河) 김진섭(金鎭燮). 곧 적
치하로 변할 서울에 마지막까지 남아 모든 신문사 가운데 최후의 호외를 박아낸 이들은 숨돌릴 틈도
없이 이별의 술잔을 나눴다.
“대책이요? 무슨 대책이 있겠소!”
“장병들은 곧 귀대하라.”
6월25일.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요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선 이일동 기자는 지프를 탄 군인들이 거리를 돌며 스피커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신문사로 달려갔다.
시청 모퉁이를 막 돌아서던 그는 외무장관 승용차가 급히 중앙청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신문사 앞에는 인민군의 남침 사실을 알리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그는 출입처인 중앙청으로 뛰어갔다.
중앙청 안은 각지에서 들어오는 전황보고로 매우 부산했지만 공산군을 금방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에 차 있는 분위기였다. 이 기회에 북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 통일을 쟁취할
수도 있으려니 하는 퍽 낙관적인 견해를 펴는 공무원들도 간혹 있었다. 이일동의 회고.
다음날인 26일에는 내가 야근을 하게 돼 있었다. 저녁에는 서울 상공에 적기가 나타나 삐라를
뿌리고 기총소사를 가했다. 그런데도 적기를 요격하는 우리 공군기는 한 대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변영권 최흥조와 함께 중앙청에 달려갔다. 중앙청 안은 하루 전, 아니 이 날 오전과도 판이하게
양상이 달라져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