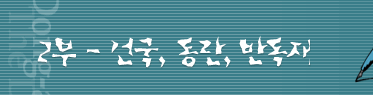| |
3. 정부 수립
46년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와 교섭을
벌인 뒤 47년부터 본격화한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운동은 마침내 9월, 마샬 미 국무장관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유엔에 상정케 하는 데 이르렀다.
이승만 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한민당과 손을 잡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성을 추진했고,
미군정의 단독정부 수립방침에 도전하는 언론들은 좌파로 분류돼 폐간처분됐다.
11월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안이 가결됐다. 소련은 이 결의에 반대하며
유엔 한국위원회가 38도선 이북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 김구는 ‘3000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라는
성명으로 단정 반대를 선언했고 김규식은 우리 민족끼리 협상해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유엔 결의를 환영하고 소련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는 논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947년
9월과 11월 미군정과 ‘조선사정협회(Voice of Kore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행부수
4만3000부인 동아일보는 ‘우익’ 혹은 ‘극우’로 평가되고 있었다. 6만1300∼6만2000부의
경향신문과 5만2000부인 서울신문이 ‘중립’, 2만5000∼3만5000부인 조선일보가 ‘중립’
혹은 ‘우익’으로 평가되던 시기였다.
과도정부하에서 기자들은 다시 분열됐다. 47년 8월 동아일보를 필두로 민중일보, 현대일보, 독립신문,
부인신문, 대한일보, 중앙통신 등 7개 신문사 기자들은 좌익 기자들이 주도하는 기존 조선신문기자회에
대항해 별도로 ‘조선신문기자협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은 동아일보 고재욱이 맡았다. 우익언론을
표방한 이들은 수도경찰청 출입기자회를 탈퇴, 별도의 출입기자단을 조직했다.
한반도의 운명이 급선회하고 있던 47년 12월2일 장덕수가 자택에서 살해됐다.
십수 년 만에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김성수가 세운 보성전문학교에 근무하다 한국민주당의 정치부장을
맡고 있던 그는 송진우가 암살된 지 2년 만에 54세로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
|
김성수는
후일 “송진우의 죽음이 민족해방의 대가였다면 장덕수의 죽음은 대한민국에 독립을 가져오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술회했다.
송진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장덕수 암살의 배후도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 앞서 7월19일에는 여운형도
배후가 불분명한 암살자에게 살해됐다.
장덕수의 죽음으로 이미 일제 시대에 유명을 달리한 그의 형 장덕준과 동생 장덕진(張德震) 등 3형제가
모두 민족운동과 관련해 희생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장덕진은 임시정부의 김구 휘하에서 활동하던
1924년 8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습격, 판돈을
휩쓸어 나오던 중 사살됐다.
8개국 대표들로 구성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일행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48년 1월8일이었다.
동아일보는 ‘유엔 위원단을 환영함’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유엔의 결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이 유엔 위원단 진입을 계속 거절하자 남측에서는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이승만 김성수
노선과 이에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 노선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2월3일 ‘총선거를
단행하라.’는 사설을 통해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은 이승만이 총선 조속
실시를 미국정부에 촉구한 날이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할 총선거 실시는 우리가 갈망한 지 이미 오래고 5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또한 이를 보장하였으니 실시 안 될 리 없건만 이를 방해하려는 비민족적 비민주적
책동도 우심한 바 있으니, 또한번 이를 강조하여 겨레의 새로운 결의와 용기를 종용하는 동시에 유엔
위원단의 심경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그 사명완수에 매진하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유엔결의에 의한 총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3대 집단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니 제1은 공산파(共産派)요
제2는 중간파(中間派)요 제3은 법통파(法統派)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