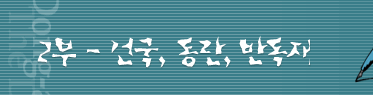| |
1. 해방정국
1940년 8월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만 5년간은
암흑이었다. 세월은 20년 이전으로 역류하여 한글로 된 신문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뿐인 시절을
다시 맞았다. 독자들은 ‘귀축 미영(鬼畜米英)을 격퇴하라.’는 슬로건 이상의 것은 신문에서 볼
수가 없게 됐다. 43년과 44년 강제 징용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려 50만 부에 육박하던 매일신보는
부모처자와 생이별하고 현해탄을 건너는 사람들을 ‘열광적 환송리에 용약(勇躍) 출발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공격을 시발로 태평양전쟁 초전을 승승장구로 이끌던 일본은 패색이
짙어지자 45년 봄부터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항복조건을 모색했다. 그들은 이미 5월에 대소(對蘇)
접근 방침을 결정해 두고 일방 그 통로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해 막판 전쟁
놀음을 다그치고 있었다. 국제 사정에 어두운 조선 내부에서는 광복을 맞을 채비를 제대로 갖출
수 없었다.
45년 7월26일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3국의 수뇌가 회담을 갖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일본 정부는 회답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8월6일 원자탄 하나로
히로시마에서 7만8000여 명이 몰살하자 다음날 내각은 천황에게 포츠담 선언 수락을 권했다.
9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이 날 일본의 최고전쟁지도자회의가 포츠담선언 수락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동안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탄이 떨어져 2만30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마라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본 내각은 방공호 속에서 천황이 직접 주재하는 철야 회의를 열었다. 갑론을박 끝에 천황은
마침내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했다.
|
|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긴급 전문이 10일 새벽 유럽 주재 일본 공관들에 타전된
데 이어 단파방송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 송출했다. 그러나 연합국측이 12일 새벽 샌프란시스코 방송을
통해 이를 거부하자 일본은 3일간의 회의 끝에 14일 정오, 무조건 항복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무조건 항복에 반대하는 근위 사단의 젊은 장교들이 한바탕 반란을 일으키는 소동을 겪은 후 14일
밤 11시50분 히로히토(裕仁) 천황은 항복 방송 녹음을 끝냈다.
그 날은 왔지만
8월15일 정오. 아베(阿部) 총독 이하 조선총독부의 전 직원은 총독부 회의실에 집합, 천황의 종전(終戰)
방송을 들었다. 총독은 비상사태에 즈음한 유시를 낭독했다. 정오 방송과 동시에 서울시내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서는 경찰관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총독부는 소집영장을 발부해 이들을 다시 불러모아 유사시에
대비한 경비에 나섰다.
잡음 때문에 확실치는 않았으나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 일본의 패전을 알리는 방송이었다. 이 날 오전 시내 여기저기에 ‘금일 정오 중대 방송, 1억
국민 필청’이라 쓰인 벽보가 나붙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서울거리는 삽시간에 흥분과 환호로 뒤덮였다.
‘그 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라며 일찍이 심훈이 읊었던 구절 그대로였다.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일반 민중에게 광복은 어느 한순간에 느닷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짐은 이미 훨씬 전부터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