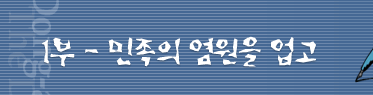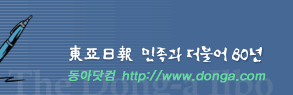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검열 기준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폐간도 어느 때나 가능하다는 암시였다.
보도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조선 역대 왕의 호에 ‘성상(聖上)’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내지(內地)’를 마치
외국처럼 표현하지 말 것” 등등.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간됐을 때만 해도 전례에 비추어 3~4개월이면 속간할 수 있으리라고들
예상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제4차 정간이 길어질 듯한 조짐을 드러냈다.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발효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자 동태파악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동아일보와
관련한 심상찮은 풍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제호를 ‘극동일보’로 갈아 민족의 대변지라는 이미지를 불식하는 방안과, 동아일보의
대표를 친일계 인사로 교체하리라는 예측까지 대두하는 분위기였다.
자진 폐간 종용
동아일보와 총독부는 백관수(白寬洙)를 사장으로 앉히는 조건으로 합의해 정간조치는 11개월 만에
풀렸지만 그 대가는 컸다. 탄압은 더욱 극심해져 글자 한자 한자까지 문제를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속간 사실을 알리는 안내 문구 ‘지면을 쇄신하는 동시에 언론기관으로 공정한 사명을 기하려
하오니…’를 ‘지면을 쇄신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 조선통치의 익찬(翼贊)을
기하려 하오니…’로 고치라고 지시하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간섭은 39년 6월 ‘편집에 관한 희망 및 유의사항’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제재조치가
불필요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정상적인 신문제작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
|
38년 2월 총독부의 강요에 따라 모든 신문은 ‘조선춘추회(朝鮮春秋會)’라는 어용단체에 가입했다.
동아일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아일보 제호에 배경으로 깔린 한반도와 무궁화 그림도 2월10일부로 삭제됐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조선인의 ‘황민화(皇民化)’를 모토로 민족말살정책에 방해가 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제거할 방침을
굳힌 총독부의 첫 처단 대상은 동아일보였다.
그 해 11월부터 총독부는 동아일보의 자진폐간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사장 백관수가 겸임하고 있던 편집국장 자리에 고재욱(高在旭)을 임명했다.
고재욱은 김성수의 장인 고정주(高鼎柱)의 손자로 1931년 입사해 경제부장 등을 지냈다.
폐간할 기색은 보이지 않고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동아일보의 움직임을 본 총독부 경무국장은
1940년 1월15일 동아일보의 백관수 사장과 송진우 고문을 불렀다.
조선일보의 방응모(方應模) 사장도 함께 불려왔다.
1923년 동아일보 정주(定州) 지국장을 거쳐 25년부터 투신한 광산업에서 모은 전 재산을 투입해
33년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는 자본금 30만 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재건해 조선일보를 반석 위에
올려 놓고 있었다.
“정세가 언론통제는 불가피하게 됐고 용지 사정도 어려워지고 후방의 ‘전시보국(戰時報國)’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언론보국(言論報國)’ 기관을 하나로 묶을 방침을 세웠다.”는 구실을 단 총독부는
일본의 건국 기념일인 2월11일을 기해 폐간하고 매일신보와 통합하라고 강권했다.
자진 폐간에 응한다면 총독부가 전 사원에게 1년치 봉급을 지급하고 윤전기 등 인쇄시설을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