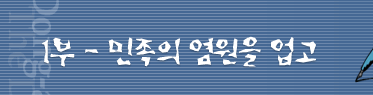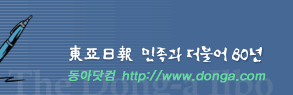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다소 시니컬한 주요한의 육성은 사설
및 논설에 관해서도 계속된다.
논설반(論說班)의 임무는 검열반에게 발목을 붙잡히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선 것은 쓰지 말고 국제 관련 사설을 많이 쓰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조선 문제를 건드리다가는 압수를 당하거나 민간검열관의 시비를 일으키기가 쉽지만
‘군축회의의 전도’니 ‘서반아의 혁명’이니 하는 제목만 쓰고 앉았으면 그런 위험이 조금도 없는
것이요, 둘째 이유로는 조선 문제는 재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신에 구미(歐美)의 사건은
외국잡지를 여기 저기 베껴먹으면 그만인 것이다.
조선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또 연구재료가 저술로 발표된 것도 적고
관청에서는 비밀주의로 잘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가르쳐준다 하여도 당일 사건을 당일에
사설로 후려때려야 하는 논설기자로서는 재료를 구하러 외근 다닐 겨를이 없다.
100행 되는 사설을 15분 만에 혼자 써보기도 하고, 또 상단 중단 하단으로 세 사람이 갈라
맡아 5분 만에 사설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장래에 신문사에 여력이 있으면 전문 연구가를 양성하여 논설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닭 알낳듯 논설을 매일 한 개씩 뽑아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반년씩 아무것도
아니 써도 놀려 먹일 도량이 간부측에 있어야 하겠다.
|
|
6. 10년의 고백
“나이는 늙고 시집살이는 고되고, 어찌하면 좋을는지?” “신문기자 생활이란 것이 언제나 전투생활이니까
쉬 늙지요.” “앞으로 기자생활 한 10년을 더 해나갈 수 있을까?” “일본인 기자는 40세가 본격인데.
조선 기자들은 퍽 어린 셈이야.”
1932년 12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등 4개 신문의 현역 기자 10여 명은 신동아
33년 신년호에 실릴 ‘신문기자’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 방담을 했다.
신문기자 자체가 당시 민중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1920년대의 민간신문 탄생 10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몸으로 겪은 언론과 사회의 실상을 회고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를 전망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사실상 ‘일제하 신문기자 10년’의 고백이라 해도 무방한 자리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서범석(徐範錫), 이길용(李吉用), 최용환(崔容煥)이 참석한 이 좌담회의 생생한 육성을
일부 발췌하면 이렇다.
― 신출 때는 언제나 흥분해 떠들고 오래 지나면 침착해지고 말지요.
기자 생활의 일반적 경향으로 보아도 10년 전에는 기분으로 떠들었고 지금 기자들은 노련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 요새는 신출 기자도 10년 전 우리가 처음 기자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심한 감격성은 없는 것 같아
보입디다.
― 신문기자뿐 아니라 조선민족 전체가 10년 전보다는 퍽 침착해진 것이 사실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