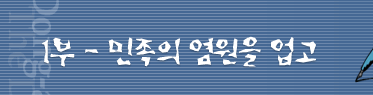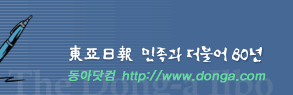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5. 탄압 속 사세 신장
특히 34년 6월22일 개최한 ‘공창(公娼)문제 강연회’는 그 대표적인 행사다.
총독부 지배가 굳어짐에 따라 뿌리 깊이 번진 공창은 조선 민중의 생활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아와
신문에는 성병치료약 광고가 지면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때였다.
이화여전 부교장 김활란(金活蘭) 등 사계 권위자들은 ‘여성운동으로 본 공창문제’ ‘법으로 본
공창문제’ ‘의학으로 본 공창문제’ 등을 강연해 생활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인 공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가정은 이와 더불어 ‘한글철자법 강습회’를 열어 여성의 문자 해독률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문화 기사에 주력
만주사변 이후 급랭한 정국에 신문에 대한 총독부 간섭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32년 11월21일부터 조석간 8면제로 확장했다.
조간 4면 석간 4면으로 구성된 이 8면 증면은, 24년에 이미 조선일보가 촉발한 증면 경쟁으로
다음해 동아일보가 가세하며 불이 붙은 바 있으나 여건 미비로 얼마 안 가 모두 포기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경험을 살려 7년 만에 부활시킨 체제였다.
지면 구성은 1면 외신, 2면 사회, 3면 지방으로 조석간이 같았고 4면은 조간은 문예, 석간은
경제로 편집했다.
또 33년 6월1일부터 지방판을 완전 분리 제작하고 11일부터는 ‘일요 부록’이 10년 만에
부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끝에 마침내 9월10일부터 10면제에 돌입해 명실상부한 대신문의
풍모를 드러냈다.
|
|
조간 6면 석간 4면의 지면은, 석간인 경우 1면 외신 사설, 2면 사회 체육, 3면 지방 연재소설,
4면 경제, 조간판은 1면 외신 및 특수연재물, 2면 사회 체육, 3면 지방, 4면 산업, 5면
문예 및 연재소설, 6면 부인 소년소녀 등으로 짰다.
그리고 36년 1월1일부터는 다시 12면제(조간 4면, 석간 8면)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10면으로 증면하던 무렵인 33년 8월, 이광수 편집국장이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설의식
편집국장 체제가 되었고, ‘ML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김준연이 주필에 취임했다.
10월에는 연희전문 교수인 정인보, 백남운, 노동규(盧東奎)와 보성전문 교수인 오천석(吳天錫),
유진오를 객원위원으로 영입해 지면, 특히 문화면의 질을 높였다.
정치와 사회기사 보도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심해 문화면 기사와 문화 사업이 신문의 활로로 자리잡아가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총독부와 정면 대결하는 것보다 신문사들끼리 편집과 영업 양면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던
때이기도 해서 특정 이슈로 심각한 대립이 벌어져 상대 신문을 비난하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점차 암울해지는 시국과는 반대로 신문의 제작 기술은 날로 발달하고 영업도 날로 신장하던 시절이었다.
발행부수가 늘어날수록 신문들은 압수 등 제재조치를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됐다.
편집국장은 영업국장의 핀잔을 받고 1927년 학예부장을 거쳐 28년부터 29년 말까지 편집국장을
지낸 주요한은 잡지부장으로 있던 34년, 신동아 31호에 쓴 ‘기자생활의 추억’이란 글에서 30년대로
접어든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