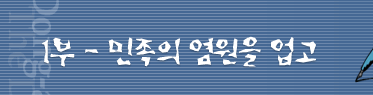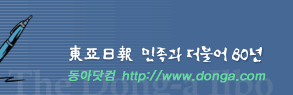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이때부터 한반도는 20여 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량공급지 겸 상품시장 노릇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대규모 침략전쟁의 인적·물적 배후지로
전락하게 된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고비로 하강기로 접어든 조선 내 항일운동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성된
전시체제(戰時體制)를 맞아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있었다.
민족 단일 전선이던 신간회(新幹會)가 1931년 5월 해산하는 것을 기점으로 국내의 합법적 항일
조직은 무너졌고 개별적인 지하활동으로 점점 많은 정치범만 양산하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됐다.
이제 항일 전선은 더욱더 국외로 집결, 무력 투쟁으로 바뀌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60여 만 명에 달하는 만주지역 동포들은 생활근거를 박탈당한 채 유랑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동아일보는 만보산사건 취재차 특파했던 서범석 기자를 계속 현지에 체류토록 하고 설의식(薛義植)
편집국장 대리를 추가 특파, 동포들의 참상을 신속히 보도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위문금품 모집에
나섰다.
당시 이광수 편집국장은 서범석 기자에게 “전황보도는 필요없다.”는 언질을 주어 전란으로 인한
동포 실태 파악과 이들에 대한 구호 대책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1932년 2월까지 동아일보에 모인 구호금품은 6만여 명이 보낸 3만2000여 원에 물품 1만7000여
점이었다. 이는 4차례에 걸쳐 현지로 전달됐다.
|
|
4.
‘민족의 저력을 기르자’
만주사변 발발을 전후해 동아일보를 비롯한 민간지들의 보도는 극도로 위축됐다.
직접적인 표현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주요 사안은 모두 암시적인 표현에 의존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총독부가 기록한 대로 동아일보의 논조는 만주사변 이래 ‘표면으로는 온건해져 지면도 개선돼왔으나 이면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사상을 그 속에 품고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하면서 힘겨운 저항을 했다.
일본을 ‘내지(內地)’로, 일본어를 ‘국어(國語)’로, 일본군을 ‘황군(皇軍)’ 혹은 ‘아군(我軍)’으로
쓰기를 강요할 정도로 낱말 하나하나까지 치밀하게 간섭하면서 총독부는 압수 삭제 정간의 철권을 더욱
강력하게 휘둘렀다.
행정처분은 발행부수가 늘어감에 따라 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압수나 삭제 등 탄압이 들어오면 만세를 부르고 더욱 기세를 올리던 것은 이미 옛날 일이 되었다.
일본 내에서조차 언론 탄압은 날로 심해졌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은 자연 ‘민족정신의 함양과 계몽을 위한 문화운동’에 주력하는 것 외에
달리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이같은 고심에 찬 방향선회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개전으로 일제의 정책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해진 것이었다.
전시체제에서 식민당국의 언론정책은 강압적 통제로 전환됐고, 1930년대의 모든 신문은 사실상 언론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