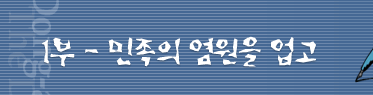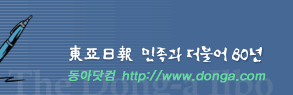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즉 유일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도기관이요
순전히 조선사람의 손으로 경영되는 유일한 사업기관인 것이다.
그래서 민중도 이것이야말로 나의 물건이요 나를 위해주는 물건이란 생각을 가졌고, 또 사업욕이
왕성한 지식계급분자가 신문을 무슨 큰 세력다툼할 자리인 줄로 생각을 한다.
신문기자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따라가며 얼굴을 보려던 시대도 옛날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사람 귀한
조선에 신문기자라면 제법 구실을 하니까 너도 나도 신문으로 덤벼드는 것이다.
외국은 갔다오고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독립운동도 할 용기가 없고, 그러니까 제 밥 먹고라도
기자 명함만 쓰게 해달라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해서 두서너 개밖에 안 되는 민간신문이
조선의 지식계급의 총집중소가 된 셈이다.
2. 광화문 시대 개막
1926년 3월1일. 3·1운동 7주년을 기념해 소련 국제농민회본부가 조선 농민에게 보내는 축전이
동아일보로 날아들었다.
동아일보는 3월5일자에 그 전보문의 사진과 함께 축전내용을 번역해 실었다.
오늘 귀국민의 슬픈 기념일을 맞아 동지로서 깊은 동정을
농업국가인 조선동포에게 드린다. …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들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는
여러 동지와 분투하는 여러 동지에게 형제애의 문안을 드린다.
이 전보문 게재 여부를 놓고 동아일보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다.
25년 총독부 경무국장 경질과 함께 신문 탄압이 한층 강화된 시점이었다.
|
|
그
해 8월 개벽지가 해외 망명 애국지사들의 근황을 소개했다가 무기정간처분을 당했고, 개벽지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가 압수당하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이 무렵 시행된 치안유지법으로 언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되는 참이어서, 조선일보는 9월9일자
사설이 문제가 돼 무기정간 처분과 함께 편집인 겸 발행인 및 인쇄인 등 고위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게재한 문제의 축전으로 동아일보는 26년 3월6일 제2차 무기정간을 당했다.
신문은 1개월 만에 속간했지만 송진우 주필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철중(金鐵中)은 기소돼 송진우 징역
6월, 김철중 금고 4월 등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다음해 2월에야 출소했다.
일본 광고 시장 개척
1926년 4월25일 조선왕조의 마지막 임금 순종황제가 승하하고 6월10일 인산(因山)날에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행렬 가운데서 ‘대한독립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6·10 만세’ 사건이었다. 동아일보는 그 역사적인 인산의 실황을 민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활동사진으로
촬영, 6월15일부터 전국 순회 상영에 들어갔다. 며칠 상영에 관중이 운집하는 것에 놀란 총독부는
중도에 영화상영을 중단케 했다.
그리고 ‘활동사진검열규칙’이란 법규를 만들어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맘때 동아일보 지면에는 ‘단군론(檀君論)’이 7월15일까지 무려 77회나 연재됐다.
3월3일부터 최남선이 집필한 이 논문은 그 해 2월 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교육협회의 기관지 ‘문교(文敎)의
조선’이 ‘소위 단군 전설에 대하여’란 논문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키자 시작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