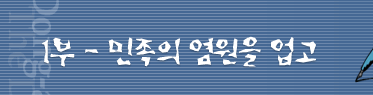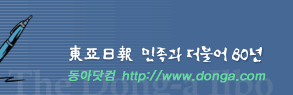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1.성장의
진통
1924년 1월2일 문제의 사설 한편이 동아일보를 장식했다.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적 생활이 없다. 왜 정치적 생활이 없나. 그 대답은 단순하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그 첫째 이유요, 병합
이래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모든 정치활동, 즉 참정권·자치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아니하는 강렬한 절개의식(節介意識)이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이유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만일 국내에서 한다면 비밀결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 내에서, 전민족적인 정치운동을 하도록 새 활로를 타개할 필요가
있다.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①우리가 당면한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②조선인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단결시켜 민족의 정치적 중심세력을 만들어 장래 정치운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그러면 그 정치적 결사의 최고 또는 최후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
정치적 결사가 생장하기를 기다려 그 결사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케 할 것이라고.
|
|
‘민족적 경륜(民族的 經綸)’이란 제목으로 이광수가 쓴 이 사설은 5회에 걸쳐 연재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제 치하의 조선 땅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려면 일제 통치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정치운동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촉구하는 이 글은 지금까지 해온 독립운동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비쳤다.
이는 필자 이광수의 개인 의견을 넘어 동아일보 편집진의 현실 인식 또는 정치 노선으로 보이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때마침 그 전 해 12월 하순부터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송진우 최원순(崔元淳)은 천도교의 최린 이종린(李鍾麟),
기독교의 이승훈, 법조계의 박승빈(朴勝彬), 조선일보의 신석우(申錫雨) 안재홍(安在鴻), 평양의
조만식(曺晩植) 김동원(金東元), 대구의 서상일(徐相日) 등 10여 명을 규합해 범 민족운동을 표방하는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 ‘연정회(政會)’라는 이름의 이 정치결사는 당시 영국 지배하에 있던 인도에서 간디의 국민회의가
취한 비타협 불복종 운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정치적 활동을 떠난 민족운동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총독정치하에서 정치적 힘을 가지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설립운동이 뚜렷한 성과 없이 좌절한 것을 총독부의 방해공작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민족운동 조직이 너무 취약하다는 현실인식이 그 저변에 있었다.
사실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한 반면 민족주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전인 23년
10월에 동아일보 위촉기자 이광수는 김성수의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안창호를 만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