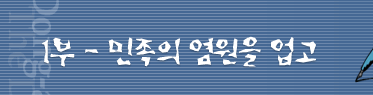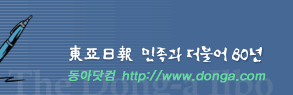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대회 직전인 11월4일, 일본의 첫 민간인 수상
하라(原敬)가 도쿄 역에서 살해됐다. 이어 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파시스트 전국대회가 열려
무솔리니가 이끄는 국가파쇼당이 발족했다. 12월31일 동아일보는 워싱턴회의와 관련해 뒤늦게 입전된
다음과 같은 외신을 전재했다.
워싱턴회의를 기회삼아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조선과 인도의 두 민족은 워싱턴에 독립운동 본부를
두고… 조선공화국 대통령이라 칭하는 이승만은 11월 중에 워싱턴에 도착하여 아마 회의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모양이다. 워싱턴에 있는 조선인들은 이번 회의에서 독립의 문턱을 이룰 여망이 없다고
비관하는 자가 있으나 독립 희망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조선독립운동자는 워싱턴회의의 미국대표를
상대로 여러 가지로 운동을 하나 회의에서 의논이 아직 되지 못하였으며, 중국대표는 조선독립에
대하여 충심으로 찬성하나 미국대표와 각국 신문기자는 별로 특별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며…
우울한 국내외 정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신예 현진건(玄鎭健)은 연말에 소설 ‘술 권하는 사회’를
발표했다.
5. 웅비
1922년 1월22일 김윤식이 사망했다. 1883년 정부에서 발행한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을 주관하고 그 후신인 ‘한성주보(漢城週報)’ 창간사를 쓴 구한말의
고위관리다.
|
|
구한말의 정치 격랑 속에 18년 동안 두 차례
귀양살이를 거쳐 김홍집의 혁신내각에서 외무대신을 맡아 내무대신 유길준(兪吉濬)과 정치개혁을 시도했으나
을사조약 이후 중추원 의장으로 이토 통감과 교유하고 합병 이후에는 작위(爵位)와 5만 원을 받은
인물, 3·1운동 직후 일본정부와 총독에게 조선독립 청원서를 보내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속히 독립을 보장하고 물러가라. 거리의 독립만세만 보지 말고 골방에서
홀로 숨어 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규탄해 투옥된 인물이다.
석방 이후 작위를 반납하고 두문불출, 회한 속에 3년을 보내다 87세로 눈을 감은 이 풍운아의
죽음을 동아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사설로 애도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가는 길을 사회장(社會葬)으로
장식하자고 호소했다. 명사 수백 명의 동조를 얻어 박영효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장 위원회까지 구성했으나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서울청년회를 주축으로 한 좌파 세력은
“이 거센 혁명의 조류 속에 일본과 일시나마, 비록 부득이하였다 할지라도, 타협한 조선 귀족에게
사회장이 될 말이냐.”며 동아일보 성토대회를 전개했다. 일찍이 창간 이래 유림과 충돌하고 기독교와
논쟁을 거친 경험이 있는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좌익과 정면 충돌한 셈이다.
민립대학운동 좌절
2월6일자 동아일보 사설 ‘민립대학(民立大學)의 필요를 제창한다.’는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