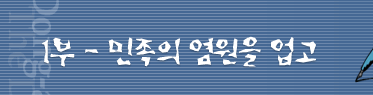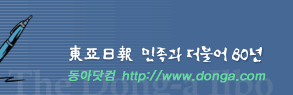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4. 본궤도에 오른 주식회사
제2차 주식 모집은 1차 때보다 성과가 좋았다. 장기간 정간이 되는 동안 신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지방 유지들의 호응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창간 무렵 예정했던 자본금 100만 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관(定款)을 개정해 자본금을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제1회 불입금
17만5000원을 확보, 마침내 주식회사가 된다. 속간 후 7개월이 지난 1921년 9월이었다.
주식회사 성립 후 김성수는 이사진으로
물러나고 3·1운동으로 투옥됐다가 출옥한 송진우가 3대 사장에 취임했다.
주식회사 발족과 더불어 동아일보는 기구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주간 대신 주필(主筆)을 두고
편집국의 통신부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부를 신설했다. 발행인 겸 편집인 이상협은 한기악으로, 인쇄인
이용문은 최익진으로 대체됐고 영업국장에는 홍증식, 공장장에는 최익진(崔益進), 서무경리국장에
양원모(梁源模)가 각각 임명됐다.
총독부가 발행·편집인 변경신청을 허가한 1월10일 현재 편집국장 이상협 휘하의 편집국은 그동안
진학문과 박일병이 퇴사한 가운데 논설반에는 김명식만 남고, 정경부장 이상협, 사회부장 김형원,
지방부장 김동혁, 정리부장 최영목, 조사부장 김동성에 학예부장은 공석으로 두었다.
주식회사 성립과 함께 재정상태가 차츰 호전되기 시작한 동아일보는 사원 전원에게 위로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처음으로 승급(昇級)도 실시했다
그러나 제2회 주식대금 불입이 여의치 않아 자금은
거의 김성수가 조달했다. 경영은 22년부터 일본 도쿄의 광고를 개척하며 사세가 신장한 24년이
돼서야 정상궤도에 올랐다.
|
|
“본보는 2000만 민중의 공유물”
3·1운동 직전 검거돼 1년7개월 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송진우의 시대가 열렸다. 일본 유학시절
사분오열해 있던 조선유학생 친목회를 통합, 그 대변지라 할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기도 한
열혈 청년 송진우는 당시 이 기관지에 ‘새 세대는 새 생활을 요구하고, 새 생활은 새 사상으로부터
발현된다.’는 논지를 펴 시선을 모은 바 있다. 그가 주도한 조선유학생친목회는 최팔용(崔八鏞)
백관수(白寬洙) 송계백(宋繼白) 등이 일으킨 도쿄 2·8선언의 토대를 이뤘다. 유진오(兪鎭午)의
회고.
김성수와 송진우는 친한 친구 사이였을 뿐 아니라 둘도 없는 동지로 거의 일심동체로 일생을 보냈다.
김성수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대는 참모 일을 맡았다면 송진우는 밖에서 장병을 지휘해
전투에 종사하는 사령관 일을 본 셈이다. 겉보기엔 풍모나 뱃심이나 활동에 있어 송진우가 형 같았으나
내용으로는 김성수가 형님뻘 아니었나 생각된다. 송진우는 호방하고 김성수는 해학을 좋아해서 술자리
같은 데서 두 사람이 맞붙으면 상대를 사뭇 헐뜯는 것 같은 농담이 벌어지는 때도 흔히 있었다.
이를테면 ‘인촌은 돈으로 사장을 했지. 나는 내 몸뚱이로 사장을 했단 말이야.’라고 송진우가
말하면, ‘오죽 미련하면 몸뚱이로 사장을 한담.’이라고 김성수가 받는 식이었다.
송진우는 사장에 취임하면서 이례적인 기명 사설을 통해 포부를 밝혔다.
본보는 일당일파의 정략적 시설이 아니라 13도를 망라한 400여 주주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며
2000만 민중의 공론을 표현하는 기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