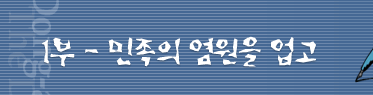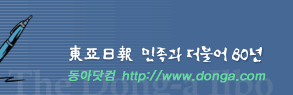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김성수는 정간이 해제되고 속간을 준비하고 있던
21년 1월 말 재혼했다. 신부는 3·1운동 당시 정신여학교 시위를 주동한 학생으로 6개월 복역을
선고받고 20년 3월 병으로 가출옥한 신여성 이아주(李娥珠)였다.
김성수는 1919년 8월 우연한 기회에 법정을 방청하다가 “조선 사람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앞으로도 그래야 할 때가 오면 독립만세를 부르겠다.”고 재판장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이아주를 처음 보았다.
3. 수난 속의 도약
비온 뒤 땅이 굳듯, 속간 이후 동아일보는 차분히
내실을 다지며 지면 쇄신과 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한편 주식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근 5개월의
공백이 가져온 타격은 엄청났다. 창간 반 년도 못 돼 당한 정간 조치는 석 달 반 만에 풀렸지만
속간하는 데는 한 달 열흘이 걸렸다. ‘무기한’ 발행정지가 한 달, 두 달, 석 달을 지나면서
초창기 신문사의 궁색한 경영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릴 정도로 취약해졌다.
총독부의 ‘응징’은 주효했다. 신문사는 운동단체이기 이전에 우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존속하기
힘든 ‘회사’라는 냉엄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였다. 논조는 일순 무뎌졌고 지면 전체에서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간의 사정을 2월21일자 속간호 ‘휴지통’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150일 동안이나 신문이 잠자고 있었던 까닭에…
여간 재미 있는 재료는 조금 잘못 내다가는 큰일이 또 날 터이니 우리의 고통도 심하다.
|
|
… 오래간만에 내는 오늘 신문도 우리의 뜻과 같이
되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다.… 차차로 우리의 팔도 풀리고 준비도
정돈되면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활동을 하여볼 터인즉 독자 여러분도 즐겁게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어 ‘횡설수설’은 “‘요새 세상 소문이 어떠한가요’하는
질문에는 대답이 좀 어려워 가슴만 답답하다. 소한 대한 입춘까지 다 지내도록 추위 같은 추위는
구경도 못하겠더니 우수 전후의 요즘 찬기운은 과연 무슨 일이야…”라고 알 듯 모를 듯한 한탄을
하고 있다. 속간 기념 1면 사설의 논조도 처연하다.
우리의 운명을 그 무엇으로 비유하며 우리의 행로를
그 무엇으로 표현할까. 광풍에 몰려가는 구름 같다 할까, 험한 파도에 흘러가는 부평초 같다 할까.
아니, 폭풍우를 거슬러 험한 길을 홀로 가는 여행자 같다고 할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
동아일보는 일찍이 그 길이 험한 줄 스스로 깨달았으며 … 우리의 운명 개척, 곧 문화향상과 생활개선에
비록 한 점이라도 기여하는 바 있기를 바랐다.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자성(自省)은 발달의
시작이다. 그러나 본보의 주지(主旨)에 어찌 한 점 변경이 있겠는가.
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문화주의를 제창하는 근본 방침에 있어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더더욱 힘을 기울여 사회교육과 산업발전에 노력하며 보도의 확실과 비평의 공정을
기하려 하니… ‘조선인 생활 향상 운동’에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려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