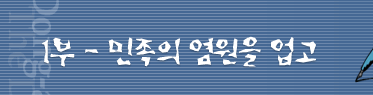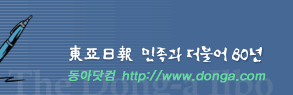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1. 항일 필봉―필화―압수의 회오리
창간특집은 끝나고 4월8일부터 일상적인 발행이 시작됐다. 이미 3·1운동 1주년을 맞아 서울·평양·선천·황주
등지에서는 한바탕 독립만세 시위가 벌어진 뒤였다.
겨레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패기에 찬 젊은이들로 구성된 ‘청년신문’ 동아일보의
논조나 제작태도는 매우 의욕적이고 전투적이었다.
동아일보는 총독의 시정(施政)을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8일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한
사설 ‘조선총독부 예산을 논함’은 헌병경찰제도를 대체한 보통경찰제도의 허실을 문제삼아 총독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일견 온건한 시책 같은 보통경찰제도가 실은 헌병 군복을 경찰복으로 바꿔 입힌 데 불과하고, 경찰관과
주재소 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독부 예산 중 경찰비가 증액됐음을 구체적으로
통박한 것이다.
1919년 당시 전체 예산의 9분의 1이던 경찰비를 1920년 7분의1로 늘리면서도 교육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음은 바로 총독부가 ‘민중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 따져 물었다.
4월19일 일본 경찰 1600여 명이 추가로 인천항에 도착했다.
4월11일부터 3차례에 걸친 사설 ‘조선인의 교육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함을 폐지하라.’에서는 신임
총독이 공약한 교육개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하는
등 역행만 일삼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본인 관리들에게 조선어를 익히라고 권장, 식민체제 강화에만 급급할 뿐 실제 조선인 교육에는
별다른 성의도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용어 따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당성을 질타했다.
|
|
특히
일본인 관리들에게 조선어를 익히라고 권장, 식민체제 강화에만 급급할 뿐 실제 조선인 교육에는 별다른
성의도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용어 따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당성을 질타했다.
총독부는 한 달 전 ‘조선어 사전’을 간행했었다.
4월11일 동아일보는 첫 주최 사업으로 ‘단군영정(檀君影幀) 현상 모집’을 공고했다.
‘우리 민족의 종조(宗祖)이시며 우리 근역(槿域)에 건국하신 제1인이시고 가장 신성하신 위대인(偉大人)’인
단군의 ‘존상(尊像)을 구하여 독자와 함께 배(拜)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한민족의 시조상(始祖像)을
다시 받들어 민족의 구심점을 삼고자 한 것으로 일제의 ‘내선일체’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전래해온 단군 영정을 모사하거나 새로 창작한 작품 모두를 받기로 한 이 공모전은 10월3일 개천절을
기해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첫 발매금지
난관은 곧 닥쳐왔다. 창간 이후 동아일보를 주시하던 총독부는 마침내 보름 만에 대응조치를 취했다.
4월15일 사회면 기사 ‘평양에서 만세소요’를 문제삼아 발매 반포 금지(發賣頒布禁止)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14일 오후 2시 평양에서 만세소동이 일어나 대소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기사는 ‘약 400명의
청년이 만세를 부르고 많은 시민이 이에 호응하자, 경찰은 크게 놀라 발포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전 시가를 뒤덮는 소란이 일어나 구속된 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1운동 첫돌을 지내며 전국 각지에서 재연한 만세운동 가운데 최대 규모였던 이 날 시위는 일제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고, 이를 빌미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비장해온 언론통제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