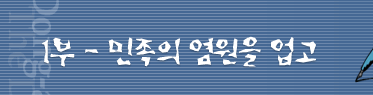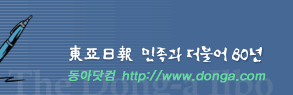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말하자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13도에서 유지(有志)들이
모이게 된 것이다.
발기인 대표 김성수가 당시 서른 살, 만 29세였고
사장 박영효와 편집감독 유근, 양기탁 등 상징성을 지닌 원로를 빼면 주간 편집국장 이하 논설반과
편집국의 기자 20여 명은 대부분 20대여서 세간에서는 동아일보의 패기만만한 진용을 보며 ‘청년신문’이라
불렀다.
부산 지국장 안희제를 비롯한 각 지국 요원들도 그 지방의 쟁쟁한 투사들이어서 지국망은 마치 합법적
민족운동의 조직체 같은 면모를 갖춰나갔다.
창간 한 달
연기 창간 목표일로 잡았던 3월1일이 다가왔으나 준비는 지지부진이었다. 무엇보다 자금난이 심각했다.
주식 2만 주의 제1회 불입금 25만 원을 제반 소요 경비로 쓸 계획이었으나 1차대전 후의 대불황에다
1919년에는 10년 만의 큰가뭄까지 겹쳐 주주들의 불입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일반 공모주는
고사하고 발기인 인수주도 제대로 걷히지 않아 1회 불입금은 10만 원을 겨우 채워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대부분은 김성수 집안의 출자였다. 창간호를 보기도 전에 경제적 난관이 먼저
찾아든 것이다.
당시의 관련 법규인 신문지법(新聞紙法)은 발행허가일 2개월 후에도 신문이 나오지 못하면 허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 규정에 따라 꼭 2개월째인 3월5일에 창간호를 내긴 했으나 무리가 따라 초반에
연일 발행을 거르는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
|
김성수는 3·1운동 1주년 기념일에 맞추려던 당초의
창간일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고 3월2일 총독부에 발행연기신청서를 제출해 4월1일로 다시 창간
날짜를 잡았다.
더 이상은 연기할 수 없어 김성수가 막 발족한 경성방직조차 심각한 자금난으로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하는 시점에 차입금을 얻어 가까스로 창간에 이르게 됐다.
3월15일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주식 가격이 대폭락하는 등 바야흐로 전후공황(戰後恐慌)이 시작하고
있었다.
김성수는 동아일보 창간을 준비하느라 전국을 순회하던 1919년 가을, 16년간 고향집을 지켜준
부인 고광석(高光錫)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지방 순회중 대구에서 만난 영남의 유지
서병오(徐丙五)로부터 ‘인촌(仁村)’이라는 호(號)를 받았다.
서병오는 김성수가 태어난 마을 이름을 딴 이 호를 주면서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호가 달리 있겠는가.”하고
말했다.
6. “主旨를 宣明하노라”
마침내 1920년 3월31일 저녁. 동아일보 4월1일자
창간호가 첫선을 보였다.
‘한국신문사’의 표현대로 ‘석양에 울리는 신문 배달 종 소리는 긴 악몽 속에서 신음하던 한민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희승의 회고대로 동아일보 창간호를 받아 쥔 서울 시민 가운데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동아일보
만세’를 외치는 이도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