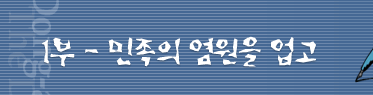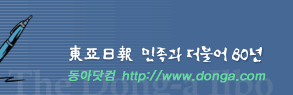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교직에 있으면서 교육이나 계몽에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조선에 방직공업을 일으켜보겠다는 포부에 차 있던 그는 김성수에게 경성직뉴를
인수하라고 강력히 권고, 경성방직을 설립하게 한 일등공신이었다.
중앙학교를 기반으로 성장한 김성수는 중앙학교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 3년 연상의 전문 공학도
이강현과 58세의 유근으로부터 차례로 방직산업과 언론사업에 착목하도록 귀중한 길안내를 받았고,
그 힌트를 헛되이 흘리지 않고 십분 수용해 현실에 접목해나가는 안목을 보였던 것이다.
김성수는 이사진 5명 중 하나로 등록, 이후 한 번도 사장직을 맡지 않았다.
어떤 일에도 가급적 표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그의 경영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불과 나흘 뒤에는
새로운 신문 발행을 신청할 정도로 그는 몸 하나를 여럿으로 나눠 써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떠들썩하는 일 없이 마치 집안일을 처리하듯 해 겉으로는 한가로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밤새 홀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지고 도면을 그리느라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 날이 드물었고
누워서도 뜬눈으로 잠을 날려버린 밤도 많았다. 일생을 두고 그를 괴롭힌 불면증은 이 무렵에 시작됐다.
5. 주식회사 동아일보 창립사무소
일단 불이 댕겨진 신문창간 작업은 빠르게 진행했다. 민간신문 발행을 허용한다는 소리가 나오자
유지들은 경쟁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겠다며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圖書課)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
|
20개에 가깝던 민간지가 합병과 함께 폐간된
10년 동안 막힌 언로를 반영하듯 신청은 10여 건에 달했다.
김성수와 이상협을 중심으로 한 새 신문 발간 팀은 화려한 진용으로 창간 준비에 돌입했다.
결국 소수의 신문만 허가될 것이고 민족의 대변지 기능을 할 신문은 하나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던 시점에 유일한 민족계 신문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김성수 쪽으로 명망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사장에는 경성방직 때처럼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해서 박영효가 내정됐고 구왕조 이래 민족주의
전통을 잇는 지도자로 유근과 양기탁(梁起鐸)이 참가했다.
양기탁은 왕조 말 가장 치열한 항일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총무를 역임하고 105인 사건에
연루돼 4년간 옥고를 치른 뒤 만주로 망명해 있다가 이 무렵 서울에 나타난 참이었다.
그 밑으로 실무를 전담할 이상협 장덕준 진학문이 포진했다. 장덕준의 아우로 당시 열혈청년을 대표하던
25세의 장덕수도 주요 포스트에 올라 있었다.
신문 이름은 유근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아일보(東亞日報)’로 정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시야를 크게 잡고 동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삼아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웅대한 의미를 담은 제호였다.
제호 글씨는 당대의 명필 김돈희(金敦熙)가 썼
다.
1919년 10월9일 동아일보는 총독부에 발행인 겸 편집인 이상협의 이름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