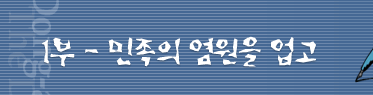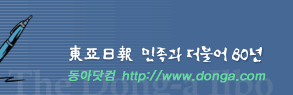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4. 중앙학교, 경성방직, 그리고 민족지
마침내 김성수는 채 30세가 되기도 전에 교육,
산업, 언론의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떠맡게 됐다. 어느 분야에도 경험이 없었고, 그 모든 분야는
하나같이 외세 앞에 전래의 봉건질서가 허물어지면서 근대적 형태를 띠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었다.
졸업 후 1914년 가을 상경해 최남선 안재홍(安在鴻) 등과 교유하면서 교육계 실정을 관찰한
김성수는 민족교육이 도탄에 빠졌음을 실감했다.
일본은 자국에서는 정부의 힘으로 미처 다 할 수 없는 국민 교육을 맡아주는 사학(私學)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반해 조선에서는 통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극력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족교육을 담당할 사립학교는 총독부의 차별적 문교정책과 학교 자체의 경영난으로 침체일로에 있었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민간 유지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1905년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실력배양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엄청난 교육열을 불러일으켰으나 1908년 일제가 인가제를 실시,
조선인 사립학교를 통제하게 되면서 차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던 터였다.
일제의 공립학교처럼 근대적 시설을 갖춘 민족교육기관을 만들려던 김성수는 마침내 ‘백산학교(白山學校)’라는
이름의 학교 설립계획안을 작성해 총독부 의사를 간접 타진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백산이라면 백두산 아닌가. 이런 사람은 설령 후지산(富士山)이란 이름을 달아 와도 안 된다.”고
학무국장 세키야(關屋貞三朗)가 화를 냈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새로운 학교를 허가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
|
“우리 민족도 남과 같이 잘 살려 함이오”
김성수가 학교를 설립하려다 총독부의 불허로 좌절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재정난에 빠져 있던 몇몇
학교에서 출자 혹은 인수경영 요청이 왔다. 그중 하나가 중앙학교였다.
당시 중앙학교는 합병 후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가 운영하던 기호학교와 흥사단(興士團)의 융희학교가
자구책으로 통합한 중앙학회(中央學會)가 경영하던 사학이었으나 폐교 직전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나쁜 상태였다.
한때 25개에 이르던 학회(學會)들은 구한말 이래의 교육열에 호응해 나타난 교육기관의 경영체이면서
한편으로 일본 세력에 대항하려는 민족운동의 조직체였으나 합병 이후 이합집산을 거치며 소수로 정리된
상태였다.
장지연의 교남교육회(嶠南敎育會), 남궁억의 관동학회(關東學會) 등 유수한 학회들과 함께 기호흥학회로
흡수된 호남학회(湖南學會)를 주관하던 고정주(高鼎柱)는 김성수의 장인이었다.
12세에 혼인한 김성수는 15세 되던 1906년 처가인 전남 창평(昌平)에서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해 후학을 양성하던 장인에게 영어를 비롯한 신학문을 배운 바
있다.
김성수는 중앙학회 회장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 주역인 김윤식과
유근 등 관계자들과 협의 후 인수를 결정, 생부의 강력한 반대에 단식으로 저항한 끝에 간신히
출자(出資) 허락을 얻어냈다.
두 부친을 설립자로 한 중앙학교 인수청원서를 총독부 학무국에 제출했으나 당국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서류를 반려하며 허가를 꺼렸다.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펴낸 ‘한일관계사료집’은 당시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