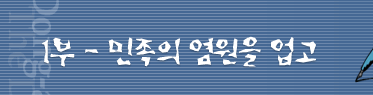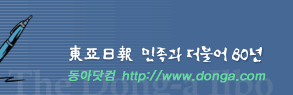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그리고 9년 후인 지난 봄 고종(高宗)황제 승하(昇遐)를
계기로 폭발한 3·1운동 때 독립투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한 그는 이제
61세의 노년이 되어 동갑인 신임총독을 영접하러 나온 것이다.
이완용은 중절모를 썼으나 서양식 예복 대신 두루마기에 엠바네스를 받쳐 입고 조선 구식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해 우왕좌왕하는데 그만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오는
버릇대로 새끼손톱을 씹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당시 유일한 한글 일간신문이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每日申報)에서 기자 생활을 막 시작한 21세의
유광렬(柳光烈)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감, 놀라셨지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놀라기는 뭘….”
10년 전,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하고 두 달 후 종현(鐘峴)천주교회당(명동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트 2세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다 19세의 이재명(李在明)에게 칼을 맞은 적 있는
그는 눈앞에서 폭탄 하나쯤 터진다고 놀랄 사람이 아니라는 태도였다.
강우규는 다음 해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몸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오.”라는
시를 남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당했다.
초지일관 일제에 충실히 부응하던 이완용은 그로부터 6년 뒤 죽었다.
사이토는 다시 10년이 지난 뒤 일본 육군의 젊은 장교들의 실패한 쿠데타인 ‘2·26 사건’
때 후배 장교들의 저격을 받고 권력의 최정상에서 최후를 맞게된다.
|
|
2.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한바탕 소요는 어둠이 깔리면서 잦아들었고 다시
날은 밝아 제 3대 총독 시대가 개막됐다.
사이토 총독은 공식집무 첫날인 9월3일 아침 총독부와 소속 관서에 훈시를 내려 몇 가지 제도개선책을
밝혔다.
“문화적인 제도혁신에 의해 조선인을 유도하고 이끌어… 정치상·사회상 대우에 있어서도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궁극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미사여구를 담은 그의 훈시는 이후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식민통치 방략의 주요 전환책을 담은 것이었다.
앞서 그가 조선총독에 임명된 지 1주일 만인 8월19일 일본 천황 이름으로 발표한 조선총독부의
새로운 통치방식은, 총독을 현역 무관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헌병경찰제를 폐지하며 지방제도를
개정해 자치제를 실시하고 산미(産米)증산계획을 통해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골간이었
다.
특히 헌병사령관이 자동으로 총감을 겸임해오던 경무총감부 위상을 총독부 경무국으로 낮추고, 도(道)
단위 경무부를 도지사 산하 경찰부로 밀어넣는 한편, 헌병대는 일반 경찰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총독부가 기존 무단정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도쿄 2·8선언과 3·1운동을 기점으로 터져나와 1919년 상반기를 뒤흔든 조선 민중의 총궐기가
일본정부에 준 충격은 크고 깊었다.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는 일본 군대의 강경진압을 계기로 폭동으로 변했고 일본 영사관과 주재소(駐在所)
습격이 빈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