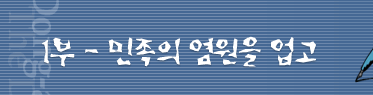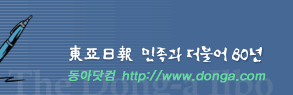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1. 총독의 소리
1919년 9월2일 오후 5시. 경성(京城·서울)의 남대문정거장(서울역). 사이토(齋藤實) 신임
조선 총독을 태운 특별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섰다.
흰색 해군대장 예복 차림으로 열차에서 내린 사이토는 총독부 관리와 외교사절, 조선귀족, 기자
등 출영객들에 둘러싸여 귀빈실에 잠시 머물다 역 광장에 대기하고 있는 쌍두마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데라우치(寺內正毅), 하세가와(長谷川好道)에 이어 제 3대 조선 총독에 부임하는 그는 이제 행정·입법·사법
및 군사통수권을 장악한 조선의 실질적 통치자가 됐다. 조선총독은 법제상 일본 내각의 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재가를 받게 돼 있으나 사실상 조선 통치의 전권을 갖는 자리였다.
3·1 독립운동
이래 혼란에 빠진 조선 지배를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시켜야 할 일본정부의 중차대한 임무를 완성한다면
그가 오를 자리는 총리 외에는 더 남은 것이 없게 된다. 3주 전인 8월12일 그에게 임명장을
주며 일본 정부는 한껏 신뢰와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다. 그것은 여느 군인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그가 보여온 고도의 책략과 정치력 때문이었다.
침묵의 시위대
역두(驛頭)에서 보이는 곳은 어디나
흰옷 입은 조선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출영 나온 일본인 조선인 귀빈 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역전에서 남대문을 지나 지금의 명동 쪽까지, 또 한편으로는 용산 쪽으로
거리를 하얗게 메웠다. 3·1만세운동으로 촉발된 2개월간의 시위를 계기로 당초의 비폭력 독립운동
노선이 일각에서는 점차 폭력투쟁노선으로 옮겨가는 기미를 보이고 있던 즈음,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부임하는 새 총독을 보러 나온 침묵의 시위대였다.
|
|
육군대장 출신인 전임 총독이 자행한 무단(武斷)정치로
민심은 말이 아니었다.
그 손상된 식민지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서라지만 해군대장 출신이 부임한다고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육군이니 해군이니 무단이니 문화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본 지배를 걷고
조선독립을 얻어내야 한다는 공감이 3월1일과 고종황제 장례일인 3월3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의
인파를 불러모은 것이다.
새로 총독으로 오는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민족의 치욕이며 사이토가 도착하는 날 조선민족은
일본제국에 어떤 회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민심의 밑바닥에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조선 독립의 열기가 거족적으로 드러난 이후 처음 부임하는 총독을 보는 나라 안팎의 눈은 예사롭지
않았다.
4년 남짓 초대 조선 통감(統監)으로 있으면서 식민지배의 토대를 완전히 구축하고 만주(滿洲)로
정복 준비 여행길에 나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安重根)의 총탄에 쓰러진
것이 10년 전. 남대문역을 중심으로 남산 북쪽 기슭 왜성대(倭城臺·지금의 예장동) 총독부에
이르는 길과 용산 총독관저까지 가는 길가에는 무장 군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서서 삼엄한 경계를
폈다. 임진왜란 때에도 왜군이 진을 친 일이 있었다는 왜성대 자리는 이토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 청사를 개청한 이래 합병 이후로 줄곧 총독부 청사로 사용돼왔다.
“비가 내려야 땅이 단단해지는 법”
사이토는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진 남산에서
울려퍼지는 예포(禮砲) 21발에 맞춰 천천히 마차로 다가갔다. 오사카 아사히(大阪朝日)신문의
다치바나 특파원과 오사카 마이니치(大阪每日)신문의 야마구치 특파원을 선두로 기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붙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