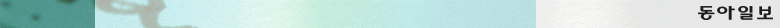|
끔찍하게 싫은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만큼 기분 좋은 일도 많으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보다는
차라리 엄마한테 더욱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다. 엄마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를 낳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앞으로 나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게 될지 몰랐던 걸까? 엄마가 그렇게나 소원했던 그림공부도 집어치워야 했는데, 그러고도
나를 낳고 싶은 이유가 뭐였을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다.
엄마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참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잡지를 홱 낚아채고 용돈을 깎아버리겠다고 윽박지르는 엄마. 겉으론 짐짝 부리듯이 마구
대하지만 속으론 나를 유리그릇만큼이나 조심스러워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우리 은아, 넌 내 보물이야, 라고 말하며 와락 안아주지만 그 순간 속으로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
엄마에 대해선 뭐든 길어진다. 그리고 늘 끝에 가선 마음이 무겁다.
역시 작문시간은 나를 힘들게 한다.

오늘의 주제는 `단짝친구'이다. 나한테 죽어라 붙어 다니는 애라고는
옆 짝 위니 밖에 없으니 위니 얘길 써야겠다 (위니는 벌써 내 얘길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못
보게 하려고 난리다).
위니와 내가 짝이 된 데에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다. 지난 학기
초, 나는 생전 처음으로 입원을 했었다. 후두염 때문이었다. 후두염이란 목감기 비슷한 것이지만
중요한 점은 감기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에 지독하다는 점이다. 열이 나고 기침이 끊이지 않으며
온몸이 쑤신다. 그리고 목구멍이 몹시 따가운데 알고 보니 그 부분이 후두라는 데였다. 이 놈의
후두염을 앓느라 학교를 열흘이나 빼먹었다. 다른 아이들은 새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갈 때에 나는
병실에서 만화책만 읽고 있었다. 처음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신났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되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학기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거다.
학교라는 델 5년쯤 다녀본 애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1학기초의
열흘이면 2학기 전체를 합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열흘 동안 대부분의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자리가 정해지고 짝이 정해지는 것도 이 때이다. 처음 말을 걸고 이름을 익히는 것도
이 때이다. 친하게 지낼 아이와 두고두고 괜스레 미워할 아이를 가려놓는 것도 실은 이 열흘동안일
때가 많다. 그토록 중요한 열흘동안을 나는 병원 침대에서 빈둥댔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열흘만에 학교에 가 보니 과연 예상 대로였다. 내가 끼일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대번에 느낄 수가 있었다. 교무실에서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나 같은 애는 벌써 오래 전에 잊어버리신 것 같았다. 후두염 때문에 결석하던
이 은아라고 말씀드렸더니 수첩이며 출석부를 오래오래 뒤적이셨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 모양으로,
나에 관한 아무것도 찾아지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은 너무나 느릿느릿, 너무나 끈질기게 뒤적이고 계셨다.
그러는 사이사이에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는데 울고 계시는 줄만 알고 나는 덜컥
걱정이 되었다. 아이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고 울고 계시나? 그러나 가만 보니 울고 계시는
건 아니었다. 뿌연 눈곱 같은 게 덮고 있는 흐릿한 눈이기는 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건 아니었다.
안경을 벗고 자꾸만 눈가를 닦는 건 아무래도 선생님의 습관인 것 같았다. 잠깐 잊었었다. 어른들은
그만한 일로 울지 않는다.
교실에서도 내가 끼일 자리는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를 몰랐고 나도 그 아이들을 몰랐다. 그렇다고
손님대접이었냐면 그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그저 내가 거기 없는 듯이 행동했다. 따로 말을 거는
아이도 없었다. 나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구는 아이도 없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바빴다. 바쁜 아이들
틈바구니에 있는 건 몹시도 외로운 일이었다. 웬만큼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서너 명 있었지만 어느새
새친구를 사귀어서 마치 두 개 짜리 듀라셀 건전지같이 꼭꼭 붙어 다녔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텐데도, 그 아이들은 나와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두려는 듯 쌀쌀맞게
굴었다. 아이들은 참 이상하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 두려고 애를 쓴다.
제일 친한 친구와 덜 친한 친구 사이에 표시나게 차별을 해 두려고
여러모로 머리를 쓰기까지 한다. 특별한 친구를 갖게 되면 일부러라도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바람에 아무하고도 특별한 사이가 되지 못하는 애는 언제나 외롭다. 입원과 같은
뜻밖의 나쁜 일을 겪느라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항의해봤자 누가 나서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나는 이러다 투명인간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다. 투명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한 투명인간이 아니라 다시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투명인간이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과학자의 실험실에 놀러갔다가 물인줄 알고 벌컥벌컥 마신 게 알고 보니 투명인간이
되는 약이었다. 더럭 겁이 나서 불투명인간으로 되돌아가는 약을 얼른 마시려다가 실수로 그만 바닥에
엎질러버린 거다. 그러니 이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불투명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 내가
꼭 그 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