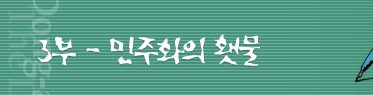| |
민주인사 50여 명이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가진 ‘민주회복 국민선언대회’도 11월27일자 1면 머리를 차지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역시 동아일보다.” “동아일보 보는 맛에 산다.”는 격려전화가 쇄도했다.
당시 사회부기자였던 김진홍(金鎭洪)은 “단 한 줄의 시위기사 속에서도 민주회복의 열망을 확인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동아일보의 보도는 국민 전체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동아 자유언론 실천운동이 민주화운동을 확산하는 형태로 급진전하자 마침내 유신정권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광고탄압으로 동아일보를 압박하게 된다.
동아 자유언론 실천운동이 한국 언론사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첫째는 언론자유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제1의 요건이라는 투철한 의지를 구현했다는 점, 둘째는
이후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기폭제가 됐다는 점이다. 국민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동아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4. 광고탄압
1974년도 저물어 가는 12월26일, 동아일보를 펼쳐든 독자들은 어리둥절했다. 4면과
5면 하단의 광고난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3면 광고난에도 낯익은 광고 대신 ‘민주시민’들의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동아일보 신문광고PR 1’이 실렸다.
이어 30일자 1면에는 김인호(金仁浩) 광고국장 이름의 호소문이 검은 띠를 두른 채 찍혀 나왔다.
‘대광고주들의 큰 광고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광고인으로서 직책에 충실하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와
같은 개인·정당·사회단체의 의견광고, 그리고 본보를 격려하는
|
|
협찬광고와 연하광고를 전국적으로 모집하오니 전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광고난에는 신문광고 강제해약을 질타하는 원로 언론인
홍종인(洪鍾仁)의 글 ‘언론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실려 있었다.
이른바 동아일보 광고탄압이다. 언론에 대한 광고탄압이란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해 겨울은 동아일보에 실로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되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온 국민의 눈물겨운 성원과 함께 그 겨울을 넘겼고, 정부의 굴복 압력을 뿌리치고
7개월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유신체제를 통해 종신집권을 꾀하던 박정희 정권에 동아일보는 늘 껄끄러운 존재였다. 많은 언론이
숨죽이고 있는 동안에도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줄기차게 유신체제를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 저명인사 70명이 발족한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움직임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는가 하면
가톨릭의 유신헌법철폐를 위한 기도회, 크고 작은 학생시위들이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거기에다 10월24일에는 동아일보사 편집·방송·출판기자들이 편집국에 모여 자유언론실천을 선언했으니
이 모든 것이 정권에는 불만이었다. 동아일보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만사형통인데 겁을 줘도 듣지
않고 구슬려도 듣지 않으니 눈엣가시일 수밖에…. 아예 동아일보를 아사(餓死)시키자는 강경론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었다. 그래서 빼든 기상천외의 카드가 광고탄압이었던 것이다.
12월16일부터 동아일보의 오랜 고객이던 광고주들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하나둘 광고 계약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해약한 고정광고는 동아일보가 19개, 동아방송이 16개. 당국이
각 기업의 책임자들을 은밀하게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결과였다.
압력을 받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