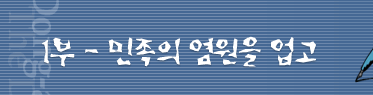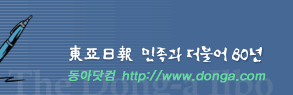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3. 제3차 정간과 1930년대
1930년 4월1일 동아일보 창간 10주년 기념호 사설은 지난 10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 세계대전의 끝을 막은 다음해 조선에 민족의 각성이
촉진됐고 그 다음해에 동아일보가 민주주의, 신문화 건설, 민중의 표현기관이라는 3대 강령을 내걸고
탄생했다.
세계대전과 조선민족의식의 각성,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동아일보다.
그때부터 조선과 조선인은 동아일보를 통해 그 재생(再生) 과정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했고 아울러
조선과 조선인의 역사를 기록했다.
동아일보의 10년은 곧 조선민족의 10년이었다. 지나간 10년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역사상 어느
10년에도 비할 수 없이 변화무쌍한 시대였다.
이 동안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등 오랫동안 역사의 페이지에서 망각되었던
국가들이 재생했고, 러시아에 미증유의 소비에트연방이 생기고 영국에는 두 번이나 노동당 내각이
생기고 이탈리아에 파시스트 전제정치가 생기고 중국에는 손문의 삼민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모든 변화를 관류하는 기본원리는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이라고 본다.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거의 평행으로 나아가면서 마침내 민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운동으로 향하려
하는 것이 지난 10년간 세계의 동향이었다.
|
|
이 동안 조선사회는 경제의 위축과 정치범의 속출과 사상계의
격류로 인해 일찍이 볼 수 없던 대혼란과 큰 공포를 이뤘다.
한편으로는 교육열의 향상과 민족의식의 훈련은 안팎으로 민족적 대단결의 기운을 촉진하고 있다. 또
급진적 조류는 4차례의 공산당 조직과 검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렇게 팽창하는 사회주의 사조도 결국은 조선의 특수성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화되고 조선화된
뒤에 민족주의에 흡수될 운명을 가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동아일보도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거쳐 오늘까지 성장했다.
첫째 난관은 자금이었다.
둘째 난관은 필화(筆禍)였다.
2차례의 발행정지와 299회의 압수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아는 이만이 알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믿음직하고 힘 있는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이 되기를 힘쓸 것이고 비영리 비당파의
철저히 도덕적이고 진리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다.
그 옆에 이광수의 축시가 실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