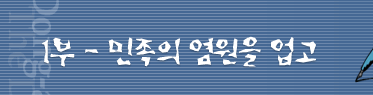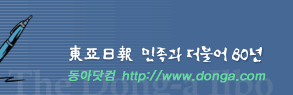| |
“민심 통일과 시정 선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언론정책은 3·1운동의
여진이 가라앉기 시작한 6월부터 여기저기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조선인에게 민간신문을 허가할 거라는 풍문은 여름방학을 맞은 도쿄 유학생들이 귀국하는 7월 무렵에는
제법 확실성을 띠고 윤곽을 드러냈다.
이미 총독부 고위관리는 총독이 경질되기 이전부터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로 합쳐 신문 발간을 출원(出願)하면
허가할 뜻을 넌지시 비치기도 했
다.
당시 일본 최고의 신문인 오사카 아사히의 유일한 조선인 기자였던 진학문(秦學文)이 총독부 고위
관리를 만난 자리에서 “민간신문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물었을 때 “한데 뭉쳐서 출원하지
그래.” 하는 대답을 들은 일도 있었다.
인책사임한 하세가와 총독이 남긴 ‘사무인계의견서(事務引繼意見書)’는 ‘언론 집회를 완화하는 일’이라는
제목을 단 마지막 장에 “언론 집회의 억압은 종래 좀 혹독하고 지나친 감이 있다.
차제에 두세 개 조선말 신문을 허락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민심 통일과 시정(施政) 선전에 쓸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선사람에게도 뭔가 좀 주어야 한다.’는 총독부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러 갈래에서 신문발간을
암중모색했으며 오사카 아사히 신문도 이 기회에 한글판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적극적인 매국 친일파를 제외한 중소 지주, 중소 자본가, 종교인, 지식인, 청년, 학생은
물론 노동자와 농민, 심지어 기생, 머슴에 이르기까지 전 민중이 참가한 3·1만세운동은 일본의
무력진압으로 5월부터 표면에서 사라져 일부는 지하로 잠복했다.
|
|
그 사이 4월에는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고, 이를 기점으로 만주 일대에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속속 출현하기 시작했다.
3·1 독립시위에 계기로 작용했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제1차대전 패전국의
영토 처분 방법으로나 유효한 것일 뿐 연합국에 속해 전승국이 된 일본의 식민지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6개월 남짓 끌어 6월에 체결한 베르사유 강화조약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서울 남산공원에서는 일본의 토신(土神)을 모시는 조선신궁(朝鮮神宮) 낙성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서반아 감기’라고 불린 신종 독감, 인플루엔자가 창궐해 서울 일원에 연일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던 여름이었다.
3. 김성수와 젊은 그들
1919년 28세의 김성수(金性洙)는 전국을
분주히 돌아다니느라 누구보다 더운 여름을 보냈다.
조선인이 만드는 최대의 방직회사라 할 경성방직(京城紡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각지 유지들을
설득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던 중이었다.
전북 고창(高敞)의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김성수는
귀국 이듬해인 1915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中央學校)를 인수해 약관 24세에 교육사업가로
등장, 세인의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는 민활한 수완으로 2년 만에 학교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자마자 1917년 당시 조선인 경영 면직류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라 할 경성직뉴(京城織紐)를 인수해 방직업에 뛰어들 기반을 마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