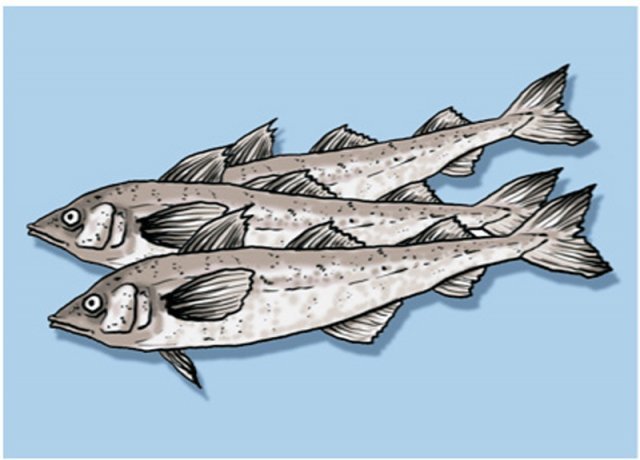

요즘 수산계는 명태 논쟁으로 떠들썩하다. 기존에는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진 것은 노가리(명태 새끼) 남획과 해류 변화 및 수온 상승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명태 어획량에서 노가리를 포함한 미성어(30cm 이하)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당시 노가리는 명태와는 다른 어종으로 인식돼 무차별적으로 어획해 명태 고갈의 단초가 됐을 것으로 믿어왔다. 이에 한 수산학자가 노가리 남획설은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해 수온 상승으로 명태가 돌아올 수 없는 바다로 변했는데 치어 방류가 무슨 소용이냐며 명태 살리기 정책까지 비판한다. 진단이 잘못됐으므로 처방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방향은 완전 양식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치어 방류를 통한 자원 회복과 민간 양식 산업화다. 2016년에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프로젝트는 성공하는 듯했다. 매년 5만 t의 어획량 확보가 가능해져 연간 48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됐다. 지금까지 180만 마리 이상의 치어를 방류했으나 가시적 효과는 없다. 민간 양식 산업화는 시설 투자비와 양식 비용 등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중단됐다. 국내산 명태를 국민의 밥상에 올리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물고기가 동해에서 사라진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명태는 추석부터 많이 잡혀서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했다. 1917년 총어획량의 28.8%를 차지할 정도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잡힌 물고기였다. 1987년 20만 t을 정점으로 급감해 2008년 공식 어획량 ‘0’이었다. 자취를 감춘 후 회복될 기미는 없다.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해양환경에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 연목구어(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한국인의 명태 사랑은 유별나서 매년 25만 t 정도가 소비돼 정부에서 비축해 두는 생선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크기, 잡는 방법, 건조 정도 등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60개나 된다.
동해는 이미 명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바다가 됐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집 나간 명태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불통’을 벗어나는 출발점[동아광장/이은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42191.1.thumb.jpg)
‘불통’을 벗어나는 출발점[동아광장/이은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러 이어 이란에 고위급 파견… 군사밀착 우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佛 ‘짜증 나는 관료주의가 경제 발목 잡아’… 우리는 다른가](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4/124642093.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