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작가 겸 연출가 시대 ▼
 1980년대까지 연극에서는 희곡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연극은 언어 중심이었고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의 완성도는 대부분 희곡의 완성도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한국 연극은 연출가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제 희곡은 연극 전체를 규정하는 대본이라기보다 공연을 위한 기본적 텍스트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나아가 극작과 연출을 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1980년대까지 연극에서는 희곡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연극은 언어 중심이었고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의 완성도는 대부분 희곡의 완성도에 크게 의존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한국 연극은 연출가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제 희곡은 연극 전체를 규정하는 대본이라기보다 공연을 위한 기본적 텍스트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나아가 극작과 연출을 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극작가로 출발한 오태석은 1970년대부터 자신의 작품을 자기 스타일로 직접 연출하면서 독특한 연극스타일을 만들어 냈고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연극계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실험적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현역’으로 손꼽힌다. 이상우 이윤택 윤영선 박근형 조광화 장진 등 요즘 알 만한 연출가들은 대부분 극작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연기, 이미지, 음악, 무대미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희곡과 결합시켜 ‘연극’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 과정에서 최용훈처럼 ‘공동창작’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혜화동 1번지'부상 ▼

예전에는 ‘어느 극단 출신이냐’ ‘누구 밑에서 연극을 배웠느냐’ 등 일종의 ‘계보’가 연극인의 미래를 규정했던 데 비해 1990년대부터는 일정한 ‘계보’가 없는 연극인들이 주류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학의 연극반이나 연극영화과 또는 해외유학 출신으로 비슷한 또래끼리 극단을 만들어 ‘겁 없이’ 독자적인 실험적 작업을 시작했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연극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혜화동 1번지’가 있다. 1994년 연극계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던 김아라 박찬빈 류근혜 이병훈 이윤택 채승훈 황동근이 공동으로 대학로 부근의 소극장에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이들의 뒤를 이어 1998년 2기를 구성한 김광보 박근형 손정우 이성열 최용훈 등이 활발한 작업을 통해 연극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들 대부분이 현재 더 큰 무대로 진출해 연극계를 주도하고 있다. 2001년에는 이미 ‘스타’가 돼서 떠난 선배들의 뒤를 이어 3기가 구성됐고 이들 역시 연극계의 기대를 모으며 한창 활동 중이다.
▼탈 대학로, 탈 서울 ▼

‘소극장’만 몰려 있는 대학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부 연극인들이 대학로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연극의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연극 관객의 대다수가 있는 ‘서울’과 ‘대학로’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지만 이들은 보다 넓고 자유로운 무대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연극을 하겠다며 과감한 ‘대학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에 집단훈련을 위한 상설합숙소뿐 아니라 야외무대도 마련해 그 지역의 새로운 관객들과도 만났다. 손진책과 ‘미추’는 경기 양주군, 김아라와 ‘무천’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이윤택과 ‘연희단 거리패’는 경남 밀양시에 각각 집단합숙훈련을 위한 공간과 야외극장을 마련하고 한국 연극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획자가 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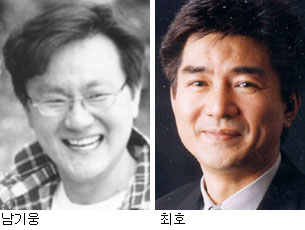
1990년대 초반까지 홍보와 티켓 판매를 담당해 왔던 극단의 ‘살림꾼’들이 작품의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담당하는 ‘기획자’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이는 연극을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난립한 이벤트회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연극산업’에 뛰어들며 연극계의 기획자 역할은 더욱 커져 갔다. 70년대 ‘화동연우회’의 유용환을 시작으로 80년대 ‘갖가지’의 심상태, ‘신시’의 박명성, ‘서울뮤지컬 컴퍼니’의 김용현 등은 기획자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는 배우 또는 스태프로 극단의 ‘살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본격 기획자로 나섰다. ‘컬티즌’의 정혜영, ‘이다’의 손상원, ‘모아’의 남기웅, ‘악어’의 조행덕 등이 극단 출신의 기획자로 이전 세대의 뒤를 잇고 있다면, ‘문화아이콘’의 정유란, ‘루트원’의 최호 등은 처음부터 연극을 산업으로 생각하고 기획자로 나선 사람들이다.
▼다양성의 시대 ▼

일제시대의 신극 운동과 반제반봉건 운동, 60년대 동인제 극단들의 실험극 운동, 70년대 이후 전통의 현대화 운동, 80년대 이후 민족극 운동….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연극계를 풍미한 연극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연극계 전체를 아우르는 연극 운동이나 화젯거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극인들은 개별 연출가를 중심으로 각기 독자적인 작업을 해 나가며 작품 하나하나의 완성과 흥행을 꿈꾸고 있을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이 연극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공동창작으로 작품에 다양한 활력을 불어넣는 최용훈, 소극장에서 아기자기한 일상성을 추구하는 박근형, 철저한 현장감각으로 활력 넘치는 작품 해석을 해내는 김광보, 만화적 상상력으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조광화, 이미지와 음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한태숙 등이 돋보인다.
이른바 ‘정통극’을 계승하고 있는 임영웅 채윤일 심재찬 등의 역할은 여전하지만, 큰 이슈보다는 일상적인 소재와 가벼운 느낌, 신체적 표현, 이미지 등을 주로 이용해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휘발유 5개월만에 1700원 돌파, 물가관리 빨간불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애딛고 느낀 한지 촉감 “ㅎ…ㅐ…ㅇ, ㅂ…ㅗ…ㄱ”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4경기 무패행진… “아직도 멈추고 싶지않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문화 주류가 바뀐다]문학](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