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의미한 연명치료 두렵다”
할머니는 자신의 동생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되뇌어 왔는데 집안에서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이 병들었을 때 현대 의학이 더는 회복시킬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혀 두고 싶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 자주 마주친다. 사전의료의향서 공증을 받아 놓으려는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이 편안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을 가족이 지켜줄지 미덥지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이 나온 2009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신 변호사는 이 판결을 끌어 낸 세브란스병원 김모 할머니 가족 측의 특별대리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보다 훨씬 앞선 15년 전에는 소극적 안락사 논쟁으로 확대된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에도 관여했었다. 존엄사와 안락사 다툼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가족 측이 ‘환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마지막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의료 현장에서 그는 법리를 논할 때 죽음의 존엄에 가치를 두고 변호한다.
“뇌성마비로 생존 자체가 어려운 1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합병증도 발생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사건으로 커졌지요. 그 병원의 의료진은 아기가 살아 있는 한 계속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갓난아기에게 사전의료의향서나 죽음에 관한 의사표현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기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신 변호사에게 내가 물었을 때 “회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 울어서 가족이 다 말렸어요. 아기 엄마 대신 고모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보단 냉정한 모습을 보였지요”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이 그 아기의 치료를 종결했는지 여부를 신 변호사는 밝히지 않았다. 나 자신도 그 결과를 알고 싶은 욕구를 가까스로 참아 냈다. 그와 나는 잠시 침묵으로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셈이다.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묻거나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내가 저 경우라면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가족 편에서 혹은 병원 편에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가족 편에 선다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의 훈련이 필요한 시대

최철주 칼럼니스트 choicj114@yahoo.co.kr
최철주의 ‘삶과 죽음 이야기’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도연 칼럼
구독
-

서울아이소울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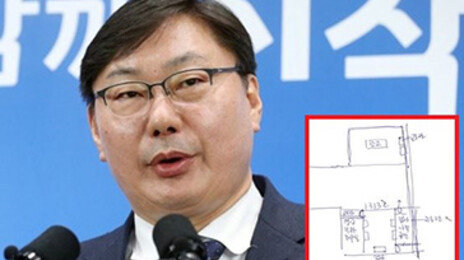
술판 장소 ‘창고→녹화실’ 말 바꿨던 이화영 측, 회유 장소 ‘검사 휴게실’ 추가 지목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바오 영화 나온다…“‘안녕, 할부지’ 9~10월 개봉 목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애기 돌 사진좀 찍었다”…카페서 가족이 소란벌이며 한 말 [e글e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539093.1.thumb.jpg)
“애기 돌 사진좀 찍었다”…카페서 가족이 소란벌이며 한 말 [e글e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철주의 ‘삶과 죽음 이야기’]세상 떠날 때, 모두가 존엄을 말한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