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 등은 이순신에게 고니시의 퇴로를 열어주라고 강요한다. 이순신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조선군의 작전권을 틀어쥐고 있던 명의 두 장수는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진린은 고니시의 연락선 한 척이 경상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포위를 풀어준다. 연락선은 사천에 있던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왜교성의 ‘곤경’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한다.
고니시 군을 구하려고 몰려오던 5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요격하다가 이순신이 순국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다. 명량에서 승리한 이후 노량에서 순국할 때까지 이순신은, ‘상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싸움을 방해했던 명군 지휘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다.
명군이 작전권을 장악하고, 민족 감정을 무시한 채 ‘밀실 협상’을 벌이고, 심지어 일본군을 비호하기까지 했지만 조선 조정은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그저 명군 지휘부에 ‘원수 일본과의 협상이란 있을 수 없으니 빨리 싸워 그들을 몰아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전부였다. 명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싸우려면 너희들이 직접 싸워 봐라’는 조롱과 비웃음이었다.
침략의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당사자이면서도 정작 전쟁의 주도권은 강대국에 넘겨준 채 ‘구경꾼’이자 ‘객체’로 전락했던 조선의 역사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반복된다.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그러했고 6·25전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략요충인 데다 우리의 역량이 미약했기 때문에 비롯된 비극이었다.
강대국 틈에 ‘끼여 있는’ 나라의 리더들은 안팎의 정세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임진왜란 무렵 조선의 리더들은 그렇지 못했다. 16세기 초반 이후 일본은 조총의 전래, 은 생산의 비약적 증대, 통일 정권의 등장 등을 통해 굴기(굴起)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에서는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하는 척신정치(戚臣政治)가 기승을 부리고 인사의 난맥, 가혹한 수탈이 이어지면서 민초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척신정치가 끝난 뒤 집권했던 사림(士林)들 또한 정쟁을 거듭하면서 나라의 활력은 잠식되었다. 그 와중에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던 격동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자강을 꾀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 갔다.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시론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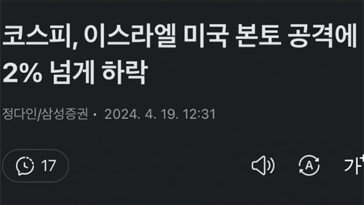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30분만에 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운 없는 ‘수배자’ 도로 한복판서 차 멈춰…밀어준 경찰에 덜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프로야구 ‘오심은폐’ 논란… KBO, 심판 3명 중징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무력화하는 낮은 성인지감수성[시론/민무숙]](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1/06/07/107297370.1.jpg)
![군사의제 빠진 쿼드 참여 고려해야[시론/김현욱]](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1/03/22/106006940.1.jpg)
![국제사회 입지 좁히는 인권 침묵[시론/박원곤]](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1/03/09/10579552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