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대출 규제 급할것 없다는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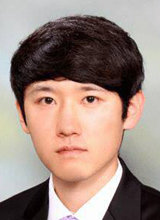
국내에 기업형 대부업체가 대거 등장한 게 이 무렵부터다. 최고 29%의 금리제한을 받던 일본 대부업체들은 한국을 ‘엘도라도(황금의 땅)’로 여겼다. 국내 사채업자들도 앞다퉈 등록하면서 대부업 시장에 둥지를 틀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검색하면 ‘연리 300%’, ‘선(先)이자만 20%’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후 살인적인 고금리가 지속됐고,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가 됐다.
이를 방관할 수 없었던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이자 제한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2002년 대출 최고금리를 66%로 제한했다. 다만 ‘시장경제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뒤에 효력이 사라지는 한시법으로 만들었다. 이후 대부업법은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효력을 유지해 왔고, 현재는 최고이자율이 34.9%로 책정돼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막이 사라진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느긋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하면 되고, 또 대부업체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낙관론일 뿐이다. 군소 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마음대로 약탈적인 이자를 매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고, 설령 법이 다시 시행된다 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가계부채가 연일 심각해지는데 금리 규제마저 사라지면 금융 취약계층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마지못해 긴급 방안을 내놨지만 우려를 떨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김준일·경제부 ji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커머스 어린이 신발 장식품서 기준치의 348배 발암물질 검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학폭으로 장애 얻은 30대, 5명 살리고 하늘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의료계 강경파, 피해는 국민 몫 [기자의 눈/박성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06/124343665.13.jpg)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원청-노조 사이 낀 하청업체만 ‘속앓이’ [기자의 눈/김형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3/13/123943007.1.jpg)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코앞서 또 뒤집은 환경부[기자의 눈/김예윤]](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3/08/123869425.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