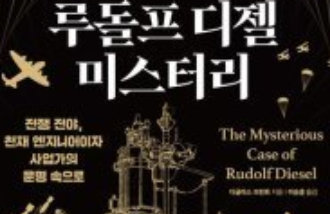[오피니언] 국민기업
자신의 직업 앞에 국민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민배우 안성기와 국민가수 조용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자고 나면 인기스타가 탄생하고 또 사라지는 세상이지만 두 사람의 인기는 수십년 동안 부침()이 없다. 좋아하는 계층도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다. 한 우물을 파는 집념과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팬들의 기대에 끊임없이 보답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치열한 프로정신 앞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장인()을 뛰어넘는 향기마저 느껴질 때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수식어에 동의할 것이다.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에게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줄 위기에 놓인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이 그제 대반격에 나섰다. 1000만주를 유상증자해 정 회장의 지분에 물 타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병법으로 치면 고육지책()이고 바둑으로 치면 죽은 돌을 살려낼 묘수라고 할 만하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숙부의 지원군이 일시에 점령군으로 바뀌는 등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있어 춘추전국시대 제후들의 쟁탈전보다 변화무쌍하다. 법과 시장의 틀 안에서라면 그들이 무슨 수단을 동원하건 크게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 회장측이 국민기업 운운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
우리에게는 쓰라린 국민기업의 추억이 있다. 국민기업의 원조는 옛 기아그룹이다. 지분이 다수 주주에게 골고루 분산돼 있고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았다 해서 기아는 이른바 국민기업으로 불렸다. 1997년 중반 기아의 부도 위기가 가시화했을 때 정부는 국민기업이라는 명분에 발목이 잡혀 처리를 질질 끌다가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았다. 나중에 기아가 현대자동차로 넘어갈 때 채권단은 7조원이 넘는 부채를 탕감해줬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메웠으니 상당부분은 국민이 부담한 셈이다.
현대그룹은 2000년 5월 이후 30조40조원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또 감자()와 부채탕감으로 소액주주와 금융회사들이 이미 본 피해만 10조원대 이상이다. 가수의 본업이 노래이고 배우의 본업이 연기이듯 기업의 본업은 수익창출이다. 국민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것으로 기업은 제 할 일을 다한 것이다. 국민기업은 여기에 더해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을 때 자처할 수 있는 호칭이다. 국민의 혈세()를 축낸 기업이 함부로 국민기업을 들먹여서는 곤란하다.
천 광 암 논설위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