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제국의 초상/이영석 지음·448쪽·2만 원/푸른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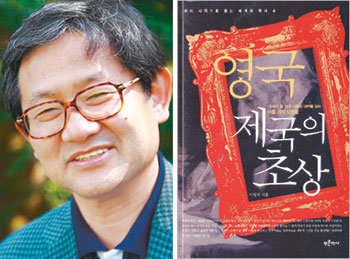
‘영국제국의 초상’은 이처럼 제국의 쇠락이 다가오던 1880, 90년대에 주목해 교육, 양극화, 인종, 종교문제 등 9가지 주제를 미시적으로 다룬 책이다. 저자인 이영석 광주대 교수(사진)는 23일 인터뷰에서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활력을 잃어가던 시기로 특히 지식층이 이를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19세기 영국 사회를 알기 위해 200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객원교수로 있던 시절 당시 나온 평론지를 뒤졌다. 19세기 후반은 평론지와 잡지의 황금시대였다. ‘19세기’ ‘웨스트민스터 리뷰’ ‘에든버러 리뷰’ ‘당대평론’ 등이 나왔고 이 중 ‘19세기’는 발행부수가 2만 부에 이를 정도였다. 이 교수는 “1880, 90년대 20년간 평론지에 나온 논설을 읽고 분석해 당시 사회를 스케치해 보려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던 영국인들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영국’의 이면이 드러난 것이다.
토머스 헉슬리, 존 틴들, 표트르 크로폿킨은 19세기 말의 저명한 과학 문필가였다. 다윈의 진화론, 1851년 만국박람회 개최, 지질학과 천문학의 발전은 당시 사람들이 과학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과학 지식 체계가 기존의 종교와 배치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었다. 당시 평론지에는 성서의 진위 문제, 진화론과 종교의 비교, 기독교 쇠퇴 등 종교에 대한 회의를 다루는 글도 자주 실렸다.
1880, 90년대는 보수당의 장기 집권이 이뤄지면서 영국 고유의 의회정치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는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통과 기존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가 19세기 말 영국사회를 특징짓고 있는 것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인문사회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그린스완’ 시대, 숲이 경쟁력이다
구독
-

기고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폐업한 모텔 화장실서 발견된 70대 백골 사체…사망 2년 지난 듯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전청약뒤 전세금 뺐는데” 71%가 사업지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책의 향기]오랜 헌신이 고통으로… 가족 간병 사회의 비극](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52.1.jpg)
![[책의 향기]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결심했다, 용서하기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27.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