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논리적이면 또 어떠한가
‘환상’도 하나의 표현수단인 것을…
장편소설 마감을 앞두고 작업실에서 두문불출 중인 작가 황정은 씨(33)를 최근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에서 만났다. 그는 더위를 참기 힘들다며 선풍기 위치를 여러 번 확인했고 인터뷰 내내 테이블 위에 놓인 장식품들을 만지작거렸다. 전체적으로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공상이 필요했던 시절’에 대해 말하던 그가 문득 생각난 듯 장식품에서 손을 떼며 양해를 구했다.
“아차,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집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딴짓하는 게 버릇이에요. 이것 때문에 대화할 때 오해를 사는 일도 많았는데, 사실 (귀로는) 다 듣고 있어요.”
공상과 딴짓의 세계에 빠져 있던 이 ‘4차원 소녀’를 현실세계로 건져 올린 것이 소설이었다. 대학 1학년 때 건강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인터넷을 통해 소설가 이순원 씨에게 창작 수업을 받다가 2005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그는 등단 전 일화를 하나 들려줬다.
“오프라인 모임 때 절 보시고 이순원 선생께서 ‘저걸 어떻게 소설가로 만들까’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심하게 낯을 가려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고 내성적인 탓에 어느 자리에서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설을 쓰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늘어났고 성격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했다.
작품 세계에 대한 질문을 꺼내려고 하자 “아, 그…‘환상성과의 접목’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선수(?)를 쳤다. 황 씨의 소설집이 출간되고 난 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바로 ‘환상성(幻想性)’이었다. 능청스러울 만큼 간결한 황정은풍의 문체도 주목거리였다. 남들이 볼 수 없는 등 뒤의 문으로 죽은 할머니가 나오거나(‘문’), 얼룩이 모기로 변해 인사를 해 오는 등의 놀라운 상황(‘모기씨’)에서도 그의 서술과 묘사에는 구구절절 긴 설명이 없다.
하지만 그는 “특이하게 말하려고 하지도, 발화 방식이나 기법 자체에 목적을 두지도 않았다”며 ‘환상성’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 대신 거침없는 환상과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변신 이면에 깔린 ‘정서적 감응’을 중시했다. 그는 “비논리적이더라도 정서적으로 밀착해 표현해 보고 싶었다”며 “환상이란 발화방식과 기법, 변신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그 밑에 깔린 이야기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역시 쓸쓸함, 소외감 같은 일반적인 정서에 대한 것들이다.
“소설에선 ‘사람에 대한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뷔작과 초기 단편들만 해도 잔인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썼는데 세상이 더 힘들어지다 보니 소설로 위악을 떨고 싶지 않더라고요. 때론 사람을 위악적으로 다루는 게 미덕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인생에 완전히 합일돼 보지 않고 냉소를 보내고 싶진 않아요.”
“등단한 이래 가장 많은 원고를 쓰고 있다”는 그는 올해 발표할 첫 장편소설의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정의 장녀인 데다 건강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는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 웃는 유일한 시간이 신문에 내 인터뷰가 났을 때”라며 “마감 때문에 인터뷰하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또 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글을 쓴다는 것이 그 자체로 환상적인 경험이라는 황 씨.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어두운 내용이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든 하이퍼텍스트처럼 이쪽저쪽을 넘나들면서 스스로 즐겁게 쓸 수 있는 작품을 써나가고 싶다”며 웃어 보였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상민 “홍준표, ‘한동훈 특검 준비’ 표현은 폭압적”[중립기어]](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547490.1.thumb.jpg)
이상민 “홍준표, ‘한동훈 특검 준비’ 표현은 폭압적”[중립기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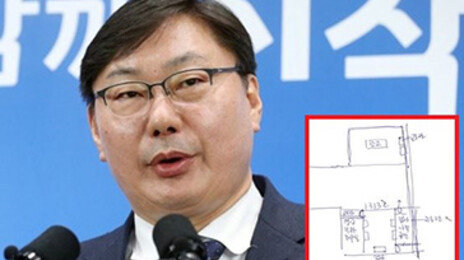
술판 장소 ‘창고→녹화실’ 말 바꿨던 이화영 측, 회유 장소 ‘검사 휴게실’ 추가 지목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