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접 자전거 타며 배우는 교통안전

교통 유치원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기 전 신호등과 표지판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통안전 규칙들을 가르친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한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어린이들은 경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신호와 표지판을 잘 지키는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만 자전거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의 5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전거를 타는 빈에서 어린이들은 스스로 시민의 일원이 된다는 성취감도 느낀다.
빈시(市) 자전거팀의 마르틴 블룸 매니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통 신호체계를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빈의 보도나 차도 대부분에는 자전거를 위한 전용차로가 갖춰져 있다. 하지만 간혹 차도를 이용할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에게도 자동차의 신호체계를 꼼꼼히 가르치는 것이다.
● 안전도 ‘최신’을 가르치는 네덜란드

10월 29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네덜란드교통안전협회(VVN)에서 마케팅과 교육을 맡고 있는 로프 솜포르스트 씨가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 있게 내놓은 답이다. 네덜란드는 내년 7월 1일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쓰는 ‘자전거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족’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자전거 스몸비족은 자전거를 몰면서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거나 메시지를 읽는다. 운전자가 메시지를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초. 평균 시속 25km로 자전거를 타면 약 20m 이상 앞을 보지 않고 달리는 셈이 된다. 자전거 운전 중 메시지를 보내는 건 더욱 위험하다. 일부는 자전거에서 두 손을 떼기도 한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차량이 가까이 오는지 모를 때도 있다. 솜포르스트 씨는 “메시지의 답장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소외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전거 스몸비 사고가 늘고 있다. 새 법은 이런 최근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운전과 휴대전화 사용 중 하나만 하라는 ‘모노(MONO) 캠페인’이다. 과거 VVN은 운전자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자전거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네덜란드 국민에게 외면을 받았다. 반면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 게 올바른 일’이란 점을 강조하며 자존감을 높인 모노 캠페인은 성공을 거뒀다.
네덜란드는 전체 인구(약 1700만 명)보다 많은 약 2200만 대의 자전거가 있는 나라다. 오스트리아처럼 자전거 교육을 어릴 때 시작한다. 정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에게 ‘자전거 안전 학위(디플로마)’를 제공한다. 1931년 시작한 네덜란드의 오랜 전통이다. 어린이들은 매년 4, 5, 6월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른다. 교통 규칙이나 안전한 이용 습관, 교통 수신호 등을 평가 받는다. 시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네덜란드 초등학생의 92%가 학위를 받고 중학교로 진학한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교통안전의 한 축을 책임진다는 점을 몸으로 익힌다.
취리히·빈=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아메르스포르트=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한국도 음주-과속운전 막는 강력한 정책 시급”▼

10월 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만난 국제교통포럼(ITF)의 베로니크 페이펠 수석연구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때 가장 참고해야 할 국가 중 하나가 스웨덴”이라며 “도로 설계부터 교통사고 원인 분석까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도로교통사고센터(IRTAD)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한 교통안전 분야의 세계적 학자다.
스웨덴의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2년 전보다 0.2명 더 줄었다. 지난해 8.1명이 숨진 한국의 30% 수준이다. 비결은 ‘비전제로(0)’ 정책이다. 1997년 스웨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내건 정책 방향이다. 도로를 설계할 때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을 막기 위해 수시로 차로 수를 1, 2개씩 바꿔 운전자가 긴장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집중했다. 스웨덴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도록 했다.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장치다. 설치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국민도 호응하며 2007년 337명이었던 스웨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35명로 줄었다. 페이펠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자의 15%가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이라며 “특히 버스 운전사 등 생계형 운전자일수록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의 차량속도를 줄이는 것도 강조했다. 과속은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페이펠 연구원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는 시속 60km도 빠르다”며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40%인 점을 볼 때 도심의 차량속도 하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리=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LGU+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상품 가격 올려…통신 3사 모두 가격 인상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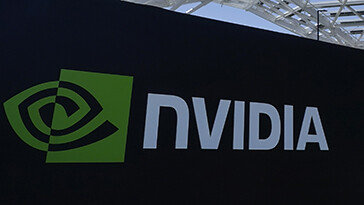
中 서버에 美가 수출 막은 반도체… 어디서 구했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벗방’ BJ에 수억원 후원한 시청자, 알고보니 ‘바람잡이’ 기획사였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