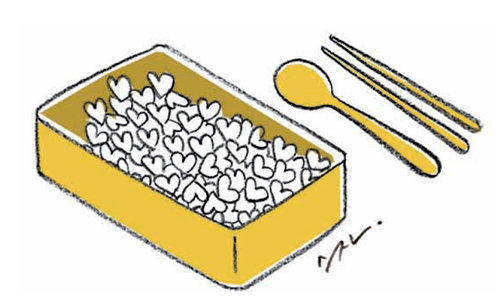
내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3, 4학년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것 같다. 교실 한가운데 조개탄 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양은 도시락들을 차곡차곡 올려 두었다. 밥이 눌어붙는 구수한 냄새로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았다.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 때라 반찬은 늘 김치에 멸치볶음, 콩자반, 어쩌다 달걀 프라이나 소시지 부침.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가 있으면 허물없이 불러 나눠 먹었고, 혼식을 장려하던 해에는 밥에 보리를 섞어서 싸왔는지 선생님이 일일이 검사하기도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게 까마득하지만. 그러고 보니 내 모친은 수년 동안 아침마다 세 개나 되는 도시락을 싸야 했을 것이다. 두 살 터울의 딸들이 셋 있으니까. 어머니가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싸준 단무지 무침은 친구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다.
간간한 닭조림, 달걀말이, 각종 야채절임, 흑임자를 뿌린 고슬고슬한 밥…. 그 도시락만큼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책상에 앉아 혼자 침묵 속에서 꼭꼭 씹어 먹던 따뜻한 밥의 맛과 도시락을 만들고 전해 주러 자동차를 몰고 온 그 가족의 마음을. 어쩌면 지금은 잊고 있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그 비슷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을 받아오면서 성장했고 어려운 시간을 건너왔을지도 모른다.
조카들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는 수요일 오늘은 불고기김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 조카들은 김밥이라면 집에서도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각자의 도시락에 담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오래된 찬합에 김밥을 담아볼까. 도처에서 꽃 소식이 들리니 한 번쯤 맛있고 보기도 좋은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싶다. 만든 것이든 받은 것이든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에는 저절로 이런 소리를 하게 되지 않나. 잘 먹겠습니다.
조경란 소설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단독]본보 ‘저주하라! 평화박람회’ 비판… 1922년 일제 동경박람회 엽서 공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이 묻는다 “1억 드리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복지의 조건]](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36095.1.thumb.jpg)
‘22년째 저출생’ 한국이 묻는다 “1억 드리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복지의 조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강 위에서 먹고 자고 일한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봉제인형](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7/03/29/83574900.1.jpg)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도시락](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7/03/22/83439041.1.jpg)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타자기](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7/03/15/8332810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