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미술관 특별전 ‘예술만큼 추한’
‘예술만큼 추한’이라는 전시 제목은 얼핏 모순으로 보인다. 예술은 아름답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런데 ‘예술=아름다움’이던가? 정영목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은 “예술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에서 열리는 ‘예술만큼 추한’전은 이 정의에 가깝다.




전시장 한쪽 벽에 걸린 장 뒤뷔페의 ‘아버지의 충고’(1954년)가 이 전시회의 연원일 것이다. 21세기의 관람객들에겐 평범해 보이는 이 작품은 그러나 세상에 선보였을 때 큰 충격을 주었다. 기이한 모양의 사람들의 모습, 모래와 자갈 등의 재료로 그려진 거친 질감 등은 앞선 회화가 보여주던 매끄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종언을 알리는 것이었다. ‘예술만큼 추한’에서는 이렇듯 기성의 미(美)에 도전하면서 표현의 에너지를 분출해 온 작가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2000∼3000원. 5월 14일까지.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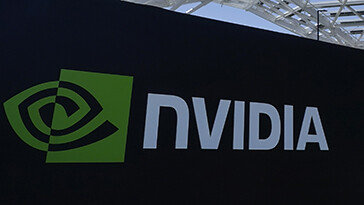
中 서버에 美가 수출 막은 반도체… 어디서 구했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 2명 출석통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